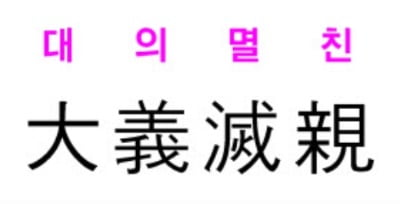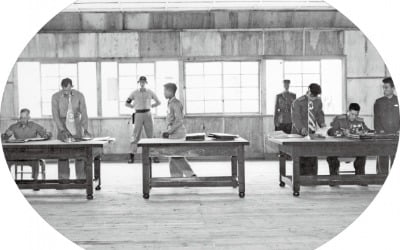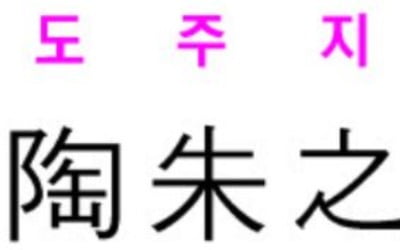-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大義滅親(대의멸친)
▶ 한자풀이大 : 클 대義 : 옳을 의滅 : 멸할 멸親 : 육친 친대의멸친大義滅親큰 뜻을 이루기 위해 친족도 죽인다는 의미국가를 위해선 부모·형제 정도 돌보지 않음 -《춘추좌씨전》석작(石)은 춘추시대 위나라의 충신이다. 그는 장공(莊公)을 섬기다 환공(桓公)의 시대가 되자 은퇴했다. 환공의 배다른 아우 주우(州)가 역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는 아들 석후(石厚)에게 주우와 교제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듣지 않았다.주우는 끝내 환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만 귀족과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주우의 참모가 된 석후는 아버지에게 민심을 되돌릴 방법을 물었다. “아비 생각에는 주우 공자께서 천하의 종실인 주(周)의 천자를 배알하고 승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무조건 주나라로 가면 천자께서 알현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테니 먼저 네가 공자를 모시고 진나라 환공(桓公)을 찾아가거라. 그분은 천자와 절친한 관계이시니, 그분의 호감을 산 후에 다리를 놓아 달라면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우와 석후는 즉시 진나라로 향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석작은 환공에게 밀서를 전달했다. “주우와 석후 두 사람은 임금을 시해한 역적이니, 귀국에 도착하면 즉각 사형에 처하소서.”진나라에 도착한 주우와 석후는 체포돼 오랏줄에 묶였다. 하지만 처벌이 문제였다. 자칫 남의 나라 내정에 끼어들어 주변국의 눈총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부 자침이 처벌은 위나라에 맡기자고 조언했고, 환공의 동의를 얻어 위나라에 그 뜻을 전했다.석작은 대신들을 소집해 즉시 사형 집행인을 진나라로 보내자고 했다. 한 대신이 조심스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전승절’과 ‘이른바 전승절’의 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7월 27일) 67주년을 맞아 군 지휘관 주요 성원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하사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이즈음 우리 언론들은 노동신문 보도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의 동향을 이렇게 전했다. 문장 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눈에 띈다. ‘이른바’는 ‘남들이 그리 말하더라’라는 뜻 더해그중에서도 ‘전승절’은 이 문맥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왜 그럴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남의 관점이 투영된 말이기 때문이다.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그것을 우리는 ‘정전기념일’이라고 한다. 남침을 감행해 전쟁의 참상을 불러온 북한에서는 이를 미화하고 자화자찬해 스스로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관점(point of view)’이라고 한다.특히 신문언어는 공공언어라 이 ‘관점’을 매우 중요시한다. ‘전승절’은 북한의 관점이 반영된, 북한의 용어임이 드러난다. 이를 그대로 인용해 쓰면 본의 아니게 타인의 표현이 나의 말로 둔갑해 전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이를 피하려면 ‘소위’ ‘이른바’ 같은 말을 넣어 남의 용어임을 나타내면 된다. ‘이른바’는 ‘세상에서 말하는 바’란 뜻이다. 즉 ‘이른바 전승절(7월 27일) 67주년을 맞아~’ 식으로 써서 그 말이 북한의 용어임을 밝히는 것이다. 문장론적 기법인 셈이다.지난 호에서 살핀 ‘기념’의 쓰임새 역시 문장 성패를 가르는 수많은 단어 용법 중 하나다. 요지는 6·25전쟁, 국권피탈, 천안함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陶朱之富(도주지부)
▶ 한자풀이陶 : 질그릇 도朱 : 붉을 주之 : 어조사 지富 : 부자 부도주지부陶朱之富도주공의 부(富)라는 뜻으로매우 큰 부자가 된 자를 이름 -《사기(史記)》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은 부(富)에 관한 얘기다. 재상이나 책사는 물론 신분이 비천한 자, 목장주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재산을 불려 권세를 누린 사례를 적고 있다. 사마천은 부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또 왕이나 제후들조차도 가난을 걱정했으니, 일반 백성의 근심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질서 의식을 벗어나 아끼고 생업에 힘쓰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바른길이라고 강조했다.“보통의 백성은 부유함을 비교해 자기보다 열 배 많으면 몸을 낮추고, 백 배 많으면 두려워하며, 천 배 많으면 그의 일을 해 주고, 만 배 많으면 그 하인이 되니,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화식열전에 나오는 구절은 부를 바라보는 사마천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도주(陶朱)는 월나라의 명신 범려의 말년 이름이다. 월왕 구천은 범려의 충언을 듣지 않고 오나라와 싸워 대패했다. 하지만 20년을 절치부심한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치욕을 갚았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은 여기서 유래한 고사다.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범려는 상장군이 되었지만 “나는 새가 죽으면 좋은 활은 광으로 들어가고, 날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는 말을 남기고 제나라로 건너갔다. 구천의 인물됨이 고생은 같이할 수 있어도 낙은 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범려는 제나라에서 이름을 치이자피로 바꾸고 장사를 시작해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 제나라에서는 그의 비
-
영어 이야기
adapt·adopt·adept 뜻과 쓰임새 알아두세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최종의 그리고 사용가능한 에너지 공급은 행성의 움직임과 중력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조석 에너지), 지구에 저장되고 분출되는 열 에너지의 흐름(지열 에너지), 특히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의 흐름(태양 복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있다. […] 서술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흐름 또는 운반체를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기술적 옵션은 이용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특성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그러므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옵션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기술적 과정과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해설>영어는 방대한 양의 어휘를 지닌 언어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어휘를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영어는 지금의 독일 북부지역으로부터 브리튼 섬으로 이주한 게르만족인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켈트어, 노르만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의 어휘를 차용하다 보니 단어의 양이 방대해지게 된 것입니다.영어에는 비슷하게 생긴 어휘가 많은데, 이 또한 학생들이 영어 어휘 습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본문에 있는 adapt는 ‘맞추다, 조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형태가 비슷한 어휘인 adopt는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Congress finally adopted the law after a three-year debate는 ‘국회는 3년의 토론 끝에 그 법을 채택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Tom was adopted two years ago는 ‘톰은 2년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늙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으리? 그러니 탄로가를 부를 수밖에…
구만 리(九萬里) 장천(長天)…/… 이 몸을 수이 늙게, 산쳔도 변거든 낸들 아니 늙을쇼냐, 청산이 녜 얼골 나노매라/ 귀밋테 해무근 서리 녹을 줄을 모른다‘늙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인간 감정을 흔들어 놓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상들의 노래들도 많다. 그 노래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자연(물)을 이용한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가)에서 ‘장천(長天)’, 즉 끝없이 잇닿아 멀고도 넓은 하늘이 ‘수이 늙’는 ‘이 몸’과 대비되고 있다. ‘구만 리’나 되어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인 하늘과 달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늙음을 자연과 인생의 대비로 표현한 (가)와 달리 (나)에서는 ‘산쳔도 변’는 것처럼 ‘나’ 또한 늙는다고, 둘 사이의 유사점을 이용해 표현했다. ‘청산(푸른 산)’이었다가 ‘황산(누런 산)’이 된 것은 청춘을 지나 늙음과 같다는 것이다. 푸른색은 젊음을, 누런색은 늙음을 표현한 것은 예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는 자연과 인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이용하였다. ‘동풍(東風, 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봄철에 불어옴.)’이 불기 전후로 산은 달라진다. ‘적설(積雪)’에 의해 흰색이었다가 봄바람이 불자 ‘청산’이 되어 푸르게 변한 것이다. 그런데 눈은 ‘서리’와 흰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흰색은 ‘귀밋테 해무근’이라는 말과 함께, 백발(白髮)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적설’의 산과 흰 머리의 인간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산과 인간은 다르다. ‘적설’은 녹지만 ‘서리’는 녹지 않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6·25전쟁을 '기념'한다니…
“6·25전쟁 기념행사가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6·25전쟁 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4일~.” 지난 6월 25일은 6·25전쟁 발발 71주년이었다. 관련 행사도 잇따라 열렸다. 그런데 이런 데 쓰인 ‘기념’이란 말은 좀 당혹스럽다. ‘기념’은 뜻깊은 일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기념행사’ 또는 ‘기념식’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왜 낯설게 느껴질까? 단어 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념(紀念)’이란 것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을 말한다. 창립 기념, 개교 기념, 무역의 날 기념식 등 잊지 말아야 할 ‘기념’이 많다. 마찬가지로 ‘기념일’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을 해마다 기억하는 날이다.핵심은 부정적(-) 개념의 일을 ‘기념’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6·25전쟁 같은 참상을 ‘기념’한다고 하면 어색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1910년 일제에 당한 국권피탈을 ‘기념’한다고 하면 망발이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피격사건도 ‘기념’하는 대상이 아니다. 좀 더 중립적 용어인 ‘추념’ 정도를 쓰는 게 좋다. 추념(追念)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다. 예문의 경우, 문맥에 따라 ‘맞다’ 동사를 활용해 “서울시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24일~” 식으로 쓰면 그만이다. 이도저도 마땅치 않을 땐 아예 ‘기념’을 빼고 “6·25전쟁 중앙행사가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처럼 써도 충분하
-
영어 이야기
enjoy, finish, avoid…뒤에 'to+동사'는 안돼요
몇십 년 전에, 나는 혹등고래의 노래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했다. 나의 관심사는 혹등고래 노래에 있는 길고 복잡하며 반복되는 패턴의 소리였다. 하지만 아마추어 음악가로서 나는 내가 듣고 있던 것이 인간 음악의 생물학적 기원에 관한 생각과 관계가 있을지 계속 궁금해했다. 고래와 인간의 삶만큼이나 서로 다른 두 포유동물의 창의적 과정과 결과물에서 음악적 유사성을 찾는 것은 흥미로웠다. 두 포유동물이 서로 유전적으로, 행동적으로 가까운 정도보다 고래나 인간에게 유전적, 행동적으로 더 가까운 다양한 종들은 노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래는 이 두 종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노래를 하는 개체와 그것을 듣는 개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복잡하고 유연한 사회적 행동이다. < 해설 >keep이라는 어휘는 I was struggling to keep awake에서처럼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을 계속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I kept wondering whether what I was hearing might be relevant to a consideration of the biological origins of human music이라는 문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kept 다음에는 [(on) 동사-ing]의 형태가 와야지, 만약 wondering 대신에 [to 동사] 형태인 to wonder가 들어가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keep과는 동사의 종류에 있어 다르지만, 동사 뒤에 [to 동사]의 형태는 허용하지 않지만 [동사-ing] 형태는 허용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enjoy, mind, finish, avoid, quit, deny, resist, practice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y resisted doing this in different ways라는 문장은 ‘그들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거부했다’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꾸밈을 받는 말의 속성을 드러내는 꾸미는 말에 이미지가 있다
플라스틱 물… 무쇠 낫… 호미… 똥덩이시는 시어의 이미지를 환기하며(불러일으키며, 떠올리며) 읽어야 한다. 이미지를 환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A는/ㄴ B’라는 문장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A는/ㄴ B’라는 문장 구조에서 A를 꾸미는 말(수식언), B를 꾸밈을 받는 말(피수식언)이라고 한다.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에는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속성(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새빨간 맛있는 사과’에서 ‘새빨간 맛있는’이라는 꾸미는 말은 ‘사과’라는 꾸밈을 받는 말의 속성인 것이다.이 작품에서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시어가 쓰였다. 이 시어의 이미지는 ‘제 손으로 만들지 않’으며, ‘한꺼번에 싸게 사’고, ‘마구 쓰’는 것이면서, ‘망가지면 내다 버’릴 수 있다는 속성에서 환기할 수 있다. 즉 ‘플라스틱 물건’은 보잘것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미’의 이미지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것이며, ‘꼬부랑’한 것이니 ‘플라스틱 물건’과는 반대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환기된다. ‘똥덩이’의 이미지는 ‘직지사 해우소(解憂所·절에서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에 있고, ‘아득한 나락(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에 놓인 세계)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므로, ‘플라스틱 물건’처럼 가치 없고 추락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편 ‘무쇠 낫’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