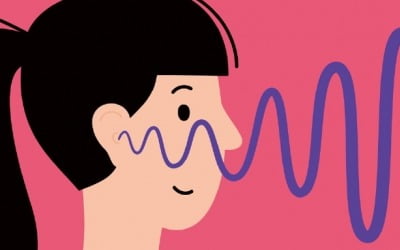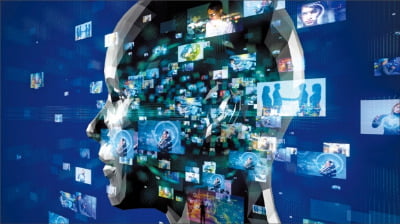-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파경 (破鏡)
▶ 한자풀이破: 깨뜨릴 파 鏡: 거울 경'깨진 거울'이라는 뜻으로부부가 금실이 안 좋아 이혼함 - 《태평광기(太平廣記)》남북조시대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陳)이 망할 즈음 낙창공주는 태자사인(太子舍人) 서덕언의 부인으로 미모가 뛰어났다. 서덕언은 부인과 헤어질 것을 늘 염려했는데, 수나라 대군이 진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더 커졌다. 진이 망하면 부인은 수의 권력자에게 넘어갈 게 뻔했다. 그는 거울을 반으로 잘라 부인과 나눠 가졌고 후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진나라는 망했고, 낙창공주는 수나라 건국 일등공신인 월국공(越國公) 양소(楊素)의 첩이 되었다. 오랜 피난 끝에 장안으로 돌아온 서덕언은 정월 보름날 장에 나가 부인이 있는지 살폈다. 그곳에는 낙창공주가 보낸 하인이 깨진 거울(破鏡)을 팔고 있었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불러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서덕언은 하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고 물었다.“내 아내는 어디 있소?” “낙창공주는 수나라 월국공 양소의 첩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께서 소인을 시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장에 나가 이걸 비싼 값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서덕언은 부인이 이미 남의 첩이 됐다는 말에 탄식하면서도 시 한 수를 지어 하인에게 주며 당부했다. “이 반쪽 거울과 함께 시를 내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시는 애절했다.거울이 당신과 함께 떠났으나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보름달 속 항아의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건만밝은 달빛은 속절없이 휘영청하구나시를 받아 읽은 낙창공주는 슬피 울면서 곡기를 끊었고, 사정을 들은 양소가 서덕언을 불러 낙창공주를 되돌려주고
-
영어 이야기
대면 수업은 in-person class라고 하고…비대면 수업은 untact class 아닌 online class라 하죠
In the latest sign that life is going back to something that resembles the pre-pandemic past, BTS is returning to the stage in Seoul.The K-pop band, which had performed in the US but not in its home country since 2019, is holding three in-person concerts in South Korea next month, the group’s management agency, HYBE Co., said on Wednesday.BTS’s return to action comes despite South Korea’s largest Covid-19 outbreak of the pandemic, which prompted the US State Department this week to advise Americans not to travel to the East Asian country. The move also comes as a fifth BTS member, out of the group’s seven individuals, tested positive for Covid-19.BTS performed on stage in front of fans in Los Angeles last fall - its first in -person performance since the pandemic began. The Los Angeles concerts sold 214,000 tickets and grossed $33.3 million, according to Billboard Boxscore.세상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장 최근 신호 중 하나로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하이브는 수요일 BTS가 다음달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대면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BTS는 그동안 미국에서는 공연을 해왔지만 고국인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한 번도 콘서트를 열지 않았다.BTS의 복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주 미국인들에게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7명의 BTS 멤버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BTS는 지난가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팬들 앞에 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뒤 첫 대면 콘서트였다. 빌보드 박스스코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티켓은 21만4000장이 팔려 333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설본문은 BTS가 한국에서 콘서트 무대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시간의 순서 고려해 원인·결과 정확하게 파악해야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왜곡 보정이 끝나면 …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1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살신성인 (殺身成仁)
▶한자풀이 殺: 죽일 살 身: 몸 신 成: 이룰 성 仁: 어질 인자신의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루다자기를 희생해 옳은 도리를 행함 - 《논어(論語)》유가(儒家)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인(仁)이다. 인은 효(孝) 충(忠) 지(智) 용(勇) 예(禮) 공(恭) 등을 포괄하는 완전한 덕이다. 유교의 근본으로, 쉽게 이룰 수 없는 최고의 덕목이다. 공자는 당시 누구에 대해서도 ‘인(仁)’의 경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그 경지를 자처하지 않았다.공자는 사람들이 예를 행하지 않는 까닭을 자신의 욕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예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극기(克己), 즉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바탕과 형식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인 역시 바탕과 형식을 모두 아우른 ‘완전한 덕(全德)’을 이른다.《논어》 위령공편에는 인을 보는 공자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려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고 했다. 지사(志士)란 도의(道義)에 뜻을 둔 사람을 일컫고 인인(仁人)이란 어진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사와 인인은 삶이 소중하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지(志)나 인(仁)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다. 오히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을 달성하려 한다(殺身成仁).”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기 몸을 죽여 인을 행한다’는 뜻으로, 자기를 희생해 옳은 도리를 지키는 것을 일컫는다. 사생취의(捨生取義) 살신입절(殺身立節)도 뜻이 비슷하다.공자는 “자기 마음을 미뤄 남을 헤아리고,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
-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요약은 주장·근거, 해석은 원인·결과가 논리적이어야
[문제1]<제시문 1> ~ <제시문 4>는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분량제한 없음, 줄노트)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을 정확히 분류하고 입장을 명명해야 합니다. 제시문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쾌락과 고통 또는 공익을 주장하는 제시문 1, 2, 4와 개인의 권리 및 존엄성을 중시하는 3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입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시문 3이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접근’이라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 2, 4를 정보사회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3을 정보사회에 대한 의무론적 관점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후 한 입장 안에서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시문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제시문 간 관계를 고려해 자연스럽게 입장을 통합하는 요약을 해야 합니다. 제시문들의 간단한 내용과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1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2, 4를 1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례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근거해야 문명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쾌락에 지배되기 때문이다.2]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그들의 경제적 동기가 생겨 지적 창작물이 원활히 생산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공유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풍부한 지적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가 창작물의 활용 이익을 얻을 수 있다.6] 미래에는 빅데이터 알
-
영어 이야기
중심축 역할하는 나라 global pivotal state로 표현…pivot은 경영에선 계획했던 수익모델의 변경을 말하죠
President-elect Yoon Suk-yeol pledges to build South Korea into what he dubs a ‘global pivotal state’ that contributes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world based on sound diplomacy and security.The former top prosecutor also emphasized the need to strengthen Korea’s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61-year-old elaborated, “We will rebuil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through our shared core values that include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human rights.”Experts say there will be an expectation for South Korea to take on responsibilities commensurate to its economic prowess and cultural influence.In the most recent example, when the US and European nations began announcing sanctions against Russia, Washington had expected Seoul to join in full force, which it did not.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또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61세인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과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서울과 워싱턴 간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한국도 전면적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설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키워드는 global pivotal state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뜻입니다. pivot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광주는 전라도 光州…광:주는 경기도 廣州 가리키죠
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늘 그렇듯이 나라 안 크고 작은 행사는 끝난 뒤에도 우리말과 관련해 곱씹어볼 과제들을 남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맞춤법 표기에서부터 발음 문제, 외래 약어 사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기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시시비비가 분명한 발음상 오류부터 살펴보자. ‘사전투표’에서 ‘사전(事前)’은 길게 발음해야대선 당일 직전 치러진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와 별개로,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우리말 발음 혼란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못지않은 주름을 지게 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방송인들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사전투표의 ‘사전’은 일(事)이 일어나기 전(前), 한자로 ‘事前’이다. ‘일 사(事)’ 자라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은 길게 발음 [사:전]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사후(事後)’도 마찬가지로 [사:후]라고 발음한다(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밑에 있는 발음 정보에서 쌍점(‘:’)으로 표시된 것은 그 말이 장음임을 나타낸다.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단음으로 발음한다). 이를 짧게 [사전]이라고 말하면 국어사전, 영어사전 할 때의 ‘사전(辭典)’을 가리킨다.대선 기간 막판에 쟁점이 된 ‘사표’ 논란도 우리말 발음에서 주의해야 할 단어다. 한 후보는 “사표(死票)는 없다. 저한테 찍는 표만이 생표(生票)가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때의 ‘사표’는 ‘죽을 사(死)’ 자로, 이는 길게 [사:표]라고 발음하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1년여 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로
-
영어 이야기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only so much…'넘쳐 난다'로는 be awash with를 쓰죠
The two founding partners share a passion for and unwavering trust in the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data science.The way Herbst puts it: “A big wave is coming and you better get on the wave.”Thanks to Deep Learning, Herbst said he is more bullish on technology than he has ever been. His reasoning is that there is only so much coding human engineers can pull off.The world is awash with data, be it videos, sound, financial data, and most of it goes unanalyzed. Using machine learning technology, the world can now process unprecedented amounts of data and extract immense value.두 창업 파트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데이터과학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허브스트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몰려올 때에는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좋습니다.”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술 분야 투자에 낙관적이라면서 그 이유는 딥러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엔지니어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코딩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세상은 영상, 음성, 금융 데이터 등 온갖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분석되지 못한 채 버려진다. (하지만)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본문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의 두 공동 창업자와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큰 변화(big wave)가 오면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좋다(you better get on the wave)”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정하거나 투자할 때 기억해 놓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인터넷붐, 소셜네트워크의 부상에서부터 암호화폐, 메타버스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