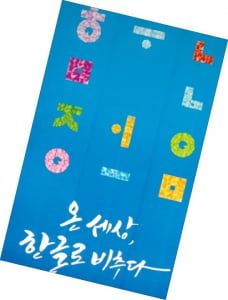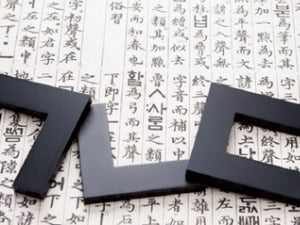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말할땐 '바디'라 해도, 적을땐 '보디'로
손흥민이 소속된 팀의 ‘Hotspur’도 미국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핫스퍼[ha:t]로 발음하겠지만 적을 때는 영국식인 홋스퍼[h⊃t]로 한다. 외래어 표기가 영국식 발음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외래어표기법이 지닌 맹점이기도 하다.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다. EPL 사무국은 지난 18일 손흥민이 EPL 소속 선수 가운데 랭킹 15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도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 중 손흥민이 단연 눈에 띈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그가 소속된 팀은 ‘토트넘 홋스퍼(Tottenham Hotspur) FC’다. 10여년 전 국가대표팀의 이영표 선수가 뛰던 곳이라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외래어 표기 기준은 영국식 발음토트넘이나 홋스퍼는 우리식으로 치면 합성어다. 각각 ‘토튼+햄’ ‘홋+스퍼’의 구성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토트넘과 토튼햄이 섞여 있고 홋스퍼 역시 핫스퍼로 쓰는 사람이 많다. 외래어표기법 1986년 공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읽고 적는 게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트넘이 맞고 토튼햄은 틀린 표기다. 핫스퍼는 홋스퍼라고 적어야 한다. 그것이 실제 발음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외래어표기법의 표음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다 영어권 외래어를 적을 때 간과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영어를 옮기는 우리 외래어 표기는 영국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명문규정은 아니지만 관용적으로 그리 해왔다.서로 다른 표기는 이미 이영표 선수 시절에도 문제가 됐다. 그러자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에서 2005년 제65차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글을 아프게 하는 '가지다'병
우리말에서 ‘가지다’가 쓰이는 용례는 너무나 다양하다. ‘가지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열 가지 이상 의미용법이 나온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뜻하는 바를 드러내는 적확한 말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 언론들은 이를 ‘세기의 담판’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무역 불균형 등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가졌다.’ ‘두 정상은 전날 만찬을 가진 데 이어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가졌다.’이들 문장에 공통적으로 쓰인 서술어 ‘가지다’는 대표적인 영어말투다. 국어학자들 사이에 이런 지적이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기사문장에서는 이 말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 그만큼 한번 새겨진 글쓰기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도 된다.‘하다, 열다, 치르다’ 등 서술어 많아어떤 주체가 ‘(회의/행사 따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영어의 ‘have’ 동사를 직역한 것이다. 이 경우 우리말법은 ‘열었다’ 쯤인데, 영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가지다’라는 술어를 무심코 많이 쓴다는 게 국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영어식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할 필요는 없다. 우리말 체계에 없는 말이라든지 또는 우리말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하지만 이미 우리말에 있는 것이라면 굳이 가져다 쓸 이유가 없다. 고릿적부터 써오던 말이 가장 자연스럽고 친숙한, 그럼으로써 소통에 더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먼지는 터는 게 아니라 떠는 거죠"
‘먼지떨이식 수사’에서 ‘-식’은 ‘방식’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그러니 도구(사물)인 ‘먼지떨이’에 붙는 것은 어색하다. 행위(동작)를 나타내는 ‘먼지떨기’에 붙을 때 자연스럽다. 정리하면 ‘먼지털이식 수사’는 다 틀린 말이다. ‘먼지떨기식 수사’라고 해야 바른말이다.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먼지털이식 수사’다.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유적으로 꼬집은 말이다. 검찰에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혐의 대상자를 샅샅이 뒤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무심코 보아 넘기기도 하지만 어법적으론 온당치 않은 표현이다. 우선 우리말에는 동사 ‘털다’와 비슷한 ‘떨다’가 있다. 따라서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그 말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그 다음 ‘먼지털이’는 ‘털다’를 명사형으로 바꿔 쓴 말인데, 우리말에는 이 경우 ‘털이’와 ‘털기’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말이 되는지’가 결정되므로 이 역시 따져봐야 한다.‘먼지털이식 수사’는 틀린 말‘털다’와 ‘떨다’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털이’는 동사 ‘털다’에서 온 말이다. ‘털다’의 사전 풀이는 ‘달려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따위가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하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불을 털다/먼지 묻은 옷을 털다/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등을 용례로 보이고 있다. 용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털다’는 어떤 몸체에 달려 있는 무언가를 떨어지게 하기 위해 그 몸체를 흔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lsqu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카스테라'의 우리말 표기는 '카스텔라'
‘카스테라’는 일본식 표기의 잔재다. 외래어 표기법이 1986년 공표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 영어의 Castella를 한글로 적을 때 카스텔라로 한다. 이를 ‘OO카스테라’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명 그대로 적은 것이다.‘대왕카스테라’의 불량식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한 종편 방송에서 무책임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내보낸 뒤 가맹점 폐업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대왕카스테라 사건은 우리말 표기에서 ‘카스테라’와 ‘카스텔라’의 차이를 돌아보게 한다. 인터넷에는 온통 카스테라란 말이 넘쳐났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1986년 공표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 영어의 Castella를 한글로 적을 때 카스텔라로 한다는 것을 안다. 이를 ‘OO카스테라’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명 그대로 적은 것이다.일본에선 제리, 우리말에선 젤리‘카스테라’는 일본식 표기의 잔재다. 그 말 자체는 스페인 카스티야 지방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6세기 대항해시대에 일본에 들어온 포르투갈인에 의해 전해졌다.(외래어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말에 뿌리를 내린 ‘빵’ 역시 마찬가지다. 포르투갈어 ‘pao(빠웅)’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카스테라’라고 읽었다. 일본어에는 받침이 부족해 영어의 유음 [l]을 받침으로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올 때 ‘ㄹㄹ’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slide는 슬라이드, boiler는 보일러, jelly는 젤리라고 적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사저'와 '자택'의 차이
사저는 관저가 있는 사람에게 개인 주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당연히 퇴임한 사람에게는 관저가 따로 없으니 사저라는 말도 적절치 않다. 그냥 집 또는 자택이라 하면 충분하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글쓰기의 출발은 정확한 단어의 선택에 있다.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단어이기 때문이다. 단어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기표(틀)다. 대충 써도 모국어 화자끼리 뜻이야 통하겠지만, 정교함이나 논리성은 갖추지 못한다. ‘정확한 단어의 선택’이 글의 품질로 연결되고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성패를 좌우하는 밑바탕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정확한 단어의 선택은 글쓰기의 출발대표적인 게 ‘사저(私邸)’의 오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사저’와 ‘자택’을 구별해 쓰던 한국경제신문은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간 소식을 전했다. 이에 비해 다른 언론들은 대부분 ‘사저’를 썼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당 연석회의에서 “의미상으로 사저는 맞지 않는다. 자택이라고 하는 게 옳다”며 “작은 것이지만 우리 당부터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자택’으로 바꿔 쓰면서 언론 보도에는 사저와 자택이 함께 나오고 있다.‘사저’는 글자 그대로 풀면 ‘개인 소유의 아주 큰 집’이다. 그런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다. 공인(公人)에게 쓰는 말이다. 공인 중에서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에 대한/대해'는 우리말을 아프게 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일(현지시간) 경기력을 올리려고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로드리게스에 대해 내년 시즌까지 211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문장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에 대해’가 들어감으로써 글이 어색해진 게 드러난다.교육부는 지난해 한글날을 앞두고 초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어투 등 외래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일본어투 표현은 ‘~에 대하여(대해)’인 것으로 나타났다.글쓰기에서 ‘~에 대한/대해’ 식의 표현이 일본어투란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막상 글을 쓰다 보면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튀어나온다. 이는 애초에 글쓰기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상투적으로 남발하는 게 늘 문제다.문장 내 군더더기로 쓰일 때 많아다만 ‘~에 대한/대해’가 일본어투라고 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또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얘기다. 비록 외래어 또는 외래어투라고 해도 우리말 체계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말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특히 이 ‘~에 대한/대해’를 딱히 일본어투라고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국어학계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과 같은 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옛 문헌을 보면 우리는 이미 15세기부터 ‘~을 대하다’란 표현을 써왔다.(이동석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에 대한/대해’를 남발해선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표현이 문장에서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맞춤법 공략하기 (30) '야 이놈아'를 줄이면 얀마? 얌마?
'이놈아'가 줄면 어떻게 될까. '임마'가 아니라 '인마'다. '놈'의 첫소리가 앞말의 받침으로 가 '인'이 되고, 끝소리 'ㅁ'은 뒷말의 머리로 연음돼 '마'가 된다. '야 이놈아'를 줄이면? 마찬가지로 '얌마'가 아니라 '얀마'다(야 이놈아 → 야 인마 → 얀마).“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다. 예전엔 길을 가다 애국가가 들리면 너나없이 멈춰서서 태극기가 있는 쪽을 향해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럴 땐 이 맹세문이 함께 흘러나왔다. 그런데 맹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잘못 표기된 곳이 하나 있다. ‘자랑스런’이란 부분이다. 실제 표기는 ‘자랑스러운’이다. 하지만 이를 ‘자랑스런’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자랑스런’은 비표준형‘자랑스럽다’는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ㅂ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 ‘자랑스러워/스러운/스러우니/스러웠다’ 식으로 받침 ‘ㅂ’이 ‘우’로 바뀐다. ‘괴롭다, 밉다, 무겁다, 맵다, 아름답다’ 등 ㅂ불규칙 용언은 모두 예외 없이 어미가 ‘우’로 바뀐다. 그런데 유난히 이 ‘-스럽다’는 ‘-스런’으로 읽고 쓰는 경향이 있다(물론 이 역시 ‘-스러운’이 맞는 표기다).그런 데는 사연이 있다. 예전부터 ‘-스럽다’는 입말에서 활용할 때 ‘-스러운’과 함께 ‘-스런’도 많이 써왔다. 지금 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2007년 수정된 것이다. 그 전에는 “나는 자랑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맞춤법 공략하기 (29) '~지 말아라/마라/말라'
2015년 전에는 "놀리지 말아요"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놀리지 마요"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말아요'를 워낙 많이 써서 2015년 12월 국립국어원은 이 역시 표준형으로 인정했어요. 지금은 '말아요'와 '마요'가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스쳐가는 얘기뿐인 걸~.” 얼핏 들어도 ‘아! 소녀시대’ 하고 제목을 떠올리던, 중독성 있는 노래다. 가수 이승철이 발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여러 가수가 리메이크해 불렀다. 처음 나왔을 때가 벌써 1989년이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말아요’는 우리 어법에 맞는 것일까? 대중가요 노랫말을 어문 규범의 잣대로 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워낙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표준 어법이다. ‘지금은’이라고 한 까닭은 2015년 말까지는 비표준형이었기 때문이다.‘말라’는 ‘말아라/마라’의 간접명령형‘말아요’는 기본형 ‘말다’에 종결어미 ‘-아요(어요)’가 붙은 형태다. 본래 용언의 어간 끝 받침 ‘ㄹ’은 어미 ‘-아’ 앞에서 줄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 ‘말다’란 단어는 관행적으로 ‘ㄹ’이 줄어진 형태로 쓰인다. 한글맞춤법 제18항에서는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고 했다. 즉 ‘말아요→마요’다. 그래서 전에는 “놀리지 말아요”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놀리지 마요”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