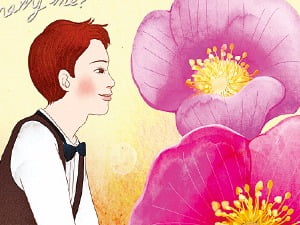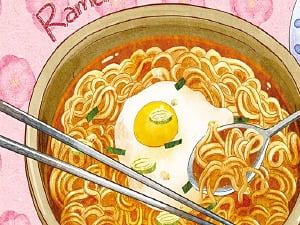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맞춤법 공략하기 (28) 그녀를 만나는 날은 '설레이지' 않다
설레는 것은 마음이 들떠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말해요. 어릴 적 소풍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는 많이 설레죠. 그런 상태를 ‘설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설레임’으로 많이 쓰는데 이는 틀린말이에요.^^롯데제과는 2003년 3월 짜 먹는 방식의 신제품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설레임’이란 이름을 단 이 제품은 출시 첫해에 매출 300억원을 올리며 단박에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외에도 특이한 작명도 한몫했으리란 것이 시장의 평가다.설레는 것은 마음이 들떠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이다. 어릴 적 소풍을 기다리면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는 설렌다. 그런 상태를 ‘설렘’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설레임’으로도 많이 쓴다. 특히 문학 작품이나 대중가요 등 이른바 ‘시적 표현’을 하는 데서 즐겨 쓴다.아이스크림 ‘설레임’은 어법 측면에서 보면 바른 말이 아니다. 다만 상표 등 고유명사를 비롯해 문학적 표현은 어법의 잣대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논외다. 하지만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설레임’은 ‘설렘’의 틀린 표기일 뿐이다.‘설레다’의 명사형은 ‘설렘’우리말에서 부족한 명사를 보완해주는 방식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접미사 ‘-이, -기, -음/-ㅁ’을 붙이는 것이다. 가령 동사나 형용사에 이들을 붙여 ‘길이, 높이, 사재기, 크기, 죽음, 젊음, 꿈, 슬픔’ 같은 말을 만든다. 그래서 ‘-이, -기, -음/-ㅁ’을 명사화 접미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맞춤법 공략하기 (26) '손이 시렵다'란 말은 없다
우리는 흔히 쓰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란 말은 잘못된 어법. ‘시려워’란 표현이 있기 위해선 ㅂ불규칙인 기본형 ‘시렵다’란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말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 말의 바른 형태는 ‘시리다’이고, 이를 활용하면 ‘시려’가 됩니다.^^아직은 한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남녘에는 어느새 봄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난 7일 부산에서는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려 때이른 봄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절기상으로도 입춘(2월4일)을 지나 우수(2월18일)를 앞두고 있다. 우수(雨水)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때이니,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는 시기다.‘시려워’가 아니라 ‘시려’가 바른말그러니 이번 겨울엔 눈 내리는 속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싸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럴 때 흔히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핀 용언의 활용으로 보면 잘못된 어법이다. ‘시려워’란 표현이 있기 위해서는 ㅂ불규칙인 기본형 ‘시렵다’란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말에 그런 단어는 없다. 이 말의 바른 형태는 ‘시리다’이고, 이를 활용하면 ‘시려’다. 전에 살펴봤듯이 ㅂ불규칙이란 ‘ㅂ’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 중 일부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활용할 때 받침 ‘ㅂ’이 ‘우’로 바뀌는 현상이다. ‘괴롭다, 밉다, 무겁다, 맵다, 아름답다’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어미가 ‘워’로 바뀐다.그런데 ‘시렵다’란 말 자체가 없으니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워…” 같은 표현은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맞춤법 공략하기 (26) '라면이 불면 맛없다'가 틀린 이유
‘ㄷ불규칙’은 어간이 ‘ㄷ’ 받침으로 끝나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때 받침 ‘ㄷ’이 ‘ㄹ’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걷다[步], 긷다, 깨닫다, 눋다, 닫다[走], 듣다[聽], 묻다[問], 붇다, 싣다[載], 일컫다’ 등이 있어요.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을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모국어 화자라면 단어 어미를 여러 형태로 말하듯이 바꿔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불규칙 용언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ㄷ불규칙’과 ‘ㅅ불규칙’은 단어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게 섞여 있어서 활용법을 더 헷갈리게 한다.‘ㄷ불규칙’은 어간이 ‘ㄷ’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들로서, 이 가운데 일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활용할 때 받침 ‘ㄷ’이 ‘ㄹ’로 바뀐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걷다[步], 긷다, 깨닫다, 눋다, 닫다[走], 듣다[聽], 묻다[問], 붇다, 싣다[載], 일컫다’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러나 ‘걷다[收, 撤], 닫다[閉], 돋다, 뜯다, 묻다[埋], 믿다, 받다, 벋다, 뻗다, 얻다, 곧다, 굳다’ 등은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다.ㄷ불규칙 활용: ‘붇+으면→불으면’가령 “이번 홍수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같은 문장을 보자. 서술어로 쓰인 ‘불었다’의 기본형이 ‘붇다’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①(물체가) 물기를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다.(예: 물에 불은 손. 국수가 불어 맛이 없다.) ②(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예: 체중이 붇다. 재산이 붇다. 식구가 둘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맞춤법 공략하기 (24) - 바닷물이 파랗네? 파라네?“와아~, 바닷물 빛깔이 정말 (파라네/파랗네).” “개나리꽃이 정말 (노라네/노랗네).”이들 문장에서 맞는 표기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이 ‘파랗네, 노랗네’를 고를 것이다. 정답은 둘 다 맞는 표기다. 여기에는 곡절이 있다.파랗다, 노랗다, 그렇다, 동그랗다 등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를 ‘ㅎ’ 불규칙 용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어미 ‘네’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받침 ‘ㅎ’이 탈락한다. 예컨대 ‘노랗다’를 보자. 이 말은 ‘노랗고, 노랗지, 노랗게’ 식으로 활용하다가 ‘노라네, 노란, 노라니, 노래, 노래지다’ 식으로 바뀐다. 모두 ‘노랗네→노라네, 노랗은→노란, 노랗으니→노라니, 노랗아→노래, 노랗아지다→노래지다’를 거친 것이다.‘허옇다’도 마찬가지다. ‘허옇네→허여네, 허옇을→허열, 허옇으면→허여면, 허옇어→허예, 허옇어지다→허예지다’ 식으로 활용한다.다만 ‘좋다’는 예외라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이 말은 ‘ㅎ’이 줄어들지 않는다. ‘ㅎ’ 불규칙이란 것은 그런 점에서 붙은 말이다. 또 동사 ‘찧다, 낳다, 닿다, 넣다, 놓다’ 따위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동사다. 한글 맞춤법 제18항 3(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에서 담고 있는 규정이다.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 중, ‘좋다’ 이외의 단어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따라서 혹여 &lsqu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맞춤법 공략하기 (23) - 동사와 형용사의 다양한 세계우리말에서 용언(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양상은 매우 탁월하고 현란하기까지 하다. 이는 교착어인 우리말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용언의 어미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말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 그런 만큼 우리 맞춤법은 용언의 활용 규칙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를 잘 지키는 것은 글쓰기의 정서법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지난 호에서 용언의 ‘탈락’과 ‘불규칙’에 대해 살펴봤다. ‘ㄹ’탈락과 ‘으’탈락 현상은 해당 음을 갖고 있는 모든 용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들을 불규칙이라 하지 않고 학교문법에서는 ‘탈락’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도 알아봤다. 그 외에는 활용 시 어간이나 어미의 변하는 양상이 단어마다 일관되지 않다. 그런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불규칙 용언’이라 부른다. 한글 맞춤법 18항이 이에 관한 규정이다.다만 한글 맞춤법에서는 탈락이나 불규칙이란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고 했다. 이는 결국 줄거나 형태가 바뀌는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탈락이나 불규칙 현상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우리말의 불규칙 용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① ‘ㅅ’불규칙: 어간 끝에 ‘ㅅ’받침을 가진 용언 가운데 일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활용할 때 ‘ㅅ’받침이 줄어든다. ‘긋다, 낫다, 붓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벗다, 빼앗다, 씻다,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맞춤법 공략하기 (22) - '탈락'과 '불규칙' 현상의 차이한글맞춤법은 모두 57개 항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은 문장부호에 관한 규정이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간단치 않은 내용이지만, 그중에서도 글쓰기에서 비교적 자주 부닥치는 항목을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다.우선 ‘소리에 관한 것’(5~13항)에서는 최소한 된소리 적는 방식과 두음법칙을 알아야 한다. ‘형태에 관한 것’(14~40항)에서는 모음조화를 이해하고 용언이 활용하는 법칙을 익혀야 한다. 나머지는 띄어쓰기(41~50항)와 그 밖의 것들이다. 이렇게 큰 틀로 나눠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 그동안 우리는 된소리 적는 방식과 두음법칙, 모음조화 등에 관해 살펴봤다. 최근 몇 차례 다루고(‘으’ 탈락,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용언) 앞으로 계속 짚어볼 활용의 법칙까지 이해하면 맞춤법의 두 축인 소리적기와 형태적기의 중요한 부분은 얼추 훑는 셈이다.용언(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개념부터 알아둬야 한다. 규칙과 불규칙을 가르는 구분은 어간이 변하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있다. 가령 ‘먹다’를 보자. 이는 먹고, 먹지, 먹게, 먹자, 먹어, 먹으면, 먹으니, 먹은, 먹어라, 먹었다… 식으로 다양하게 변하지만 어간 ‘먹’은 늘 바뀌지 않고 고정된다.이에 비해 ‘놀다’는 바뀌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이는 ‘놀고, 놀지, 놀게, 놀자, 놀아, 놀면, 노니, 논, 놀아라, 놀았다…’ 식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노니, 논’이 문제가 된다.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이를 학술적으로는 ‘음운환경이 달라질 때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맞춤법 공략하기 (21) - '르' 불규칙, '러' 불규칙도 있다“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삼형제 가수 산울림이 1980낸대 초 부른 가요 ‘청춘’의 도입부에 나오는 노랫말이다. 나이 듦을 구슬픈 목소리로 잔잔하게 불러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하지만 노랫말에 나오는 ‘푸르른’은 아쉽게도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이 말의 관형형은 ‘푸른’만 인정됐었다. 2015년까지는 그랬다. 언중이 ‘푸르르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 나름대로 쓰임새가 인정돼 국립국어원은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채택했다. 2015년 12월 ‘푸르르다’는 ‘푸르다’를 강조해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랐다. 정식 단어가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푸르른~’을 마음껏 써도 된다.지난 호에서 잠그다, 치르다, 담그다, 예쁘다 등 ‘으’ 탈락(‘으’ 불규칙) 용언의 활용 형태를 살펴봤다. 이들은 모두 ‘잠가, 치러, 담가, 예뻐’ 등 어간의 ‘으’가 모음어미로 연결될 때 탈락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런데 ‘푸르다’ 역시 ‘푸르고, 푸르니, 푸르지’ 하다가 모음어미가 연결되면 ‘푸르러, 푸르렀다’ 식으로 어간의 일부 형태가 바뀐다. 이때 주의할 것은 ‘푸르다’의 경우는 ‘으’ 탈락 용언과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다.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러’ 발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를 따로 ‘러’ 불규칙이라고 한다. ‘러’ 불규칙 용언에는 이 외에도 ‘이르다(至ㆍ이르러/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맞춤법 공략하기 (20) - '으' 탈락 단어 사용의 이해 ②지난 호에서 ‘으’ 탈락 용언에는 어떤 게 있고, 이를 구별하는 요령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은 발음을 해보면 대부분 알아챌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런데 이 ‘으’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잘못된 발음에 이끌려 자칫 표기까지 틀리기 십상인 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담그다’가 대표적인 사례다. 요즘은 김장을 담그는 집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집집마다 겨우내 식구들이 먹을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김장김치를 담궜다”라고 쓰는데, 이는 틀린 표기다. ‘담그다’가 기본형이므로 ‘담갔다’로 해야 바르다.이 말은 ‘으’불규칙 동사다. 활용할 때 ‘담그면, 담그니’ 하다가 ‘담가서, 담가라’처럼 어간의 ‘으’가 떨어져 나간다. 이때 ‘담그다’의 어간 일부가 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특성 중 하나인 모음조화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이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아, 오’)이냐 음성(그 외 ‘애, 어, 우, 으, 이’ 따위)이냐에 따라 뒤에 붙는 어미도 양성(아)이나 음성(어)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담그다’의 경우 어간의 모음이 음성이므로 활용할 때 1차로 ‘담그+어’가 된다. 이때 이 말은 ‘으’가 탈락하는 동사이므로 일단 ‘담거’로 바뀐다. 그 뒤 잇따라 일어나는 모음조화에 따라 어미 ‘어’가 ‘아’로 바뀌어 결국 ‘담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