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휴대폰이 일상의 필수품이 된 디지털 시대에는 ‘내 손안의 사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종이사전에 담겨 있는 언어와 문화의 변천, 역사성을 찾아볼 기회는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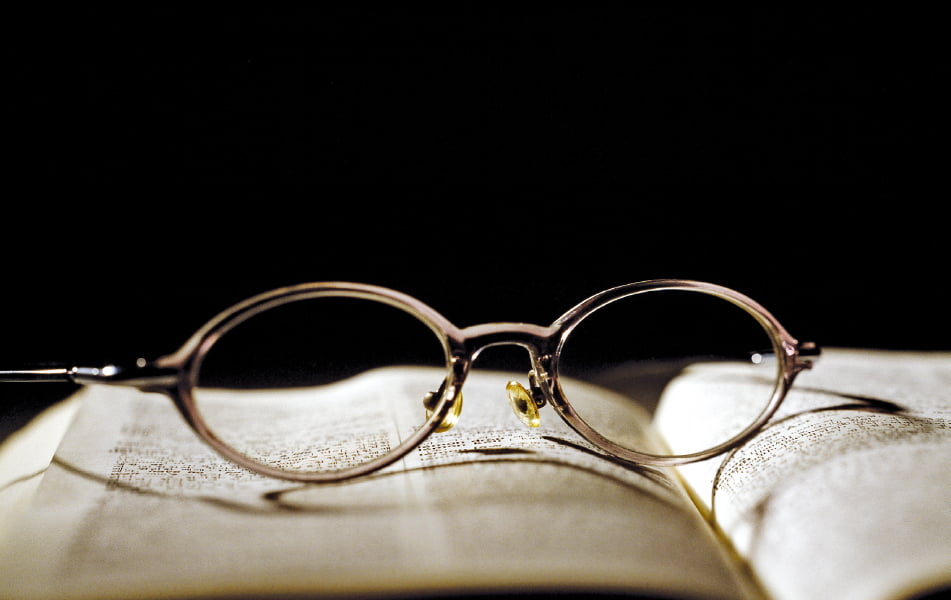
선생은 1911년 최남선이 주도한 조선광문회에서 우리말 사전 편찬에 착수했다. ‘말모이’(말을 모은 것)라는 순우리말 이름의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강연록 ‘낱말 하나하나에 담은 겨레의 얼’에 따르면, 이는 민족 스스로 자기 말의 사전을 만들려 한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훗날 한글학회가 펴낸 <조선말 큰사전>의 밑거름이 됐다.
일제강점기 국어의 수난사는 곧 우리 민족이 겪어낸 질곡의 역사였다. 그중에서도 1942년 터진 ‘조선어학회 사건’은 우리말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때 이윤재,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장지영, 안재홍, 이은상 선생 등 당대 우국지사가 대거 투옥됐다. 특히 이 사건으로 당시 16만여 어휘를 모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던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이 중단된 것도 큰 시련이었다. 그 와중에 사전 원고마저 잃어버려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 서울역 화물 창고에서 원고 뭉치를 찾아 1947년 제1권에 이어 195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6권을 펴냈다.‘마음의 양식’ 기르던 종이 사전의 추억한글학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완간한 <조선말 큰사전>은 훗날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의 밑거름이 됐다. 이 사전은 정부가 나서서 1992년부터 8년여에 걸쳐 120억 원가량을 투입한 대사업이었다. 상·중·하 세 권에 7000쪽이 넘고 올림말 역시 표준어를 비롯해 북한어, 사투리, 옛말 등 50만 단어 이상을 수록한 방대한 책이다.
하지만 100여 년에 이르는 국내 종이사전의 역사는 곧이어 조종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 “국립국어원에서 1999년에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판을 인터넷 사전(웹 사전)으로만 편찬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 국립국어원은 향후 나올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온라인으로만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사전이나 전자사전이 전통의 종이사전을 상당 부분 대체했기 때문이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주차시키다, 입금시키다"의 남용과 오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56.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어색한 까닭](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776.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한자어인 듯 한자어 아닌 우리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