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일회용 마스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스크를 소비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 세계에서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약 9000억 개로 추산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이 급증한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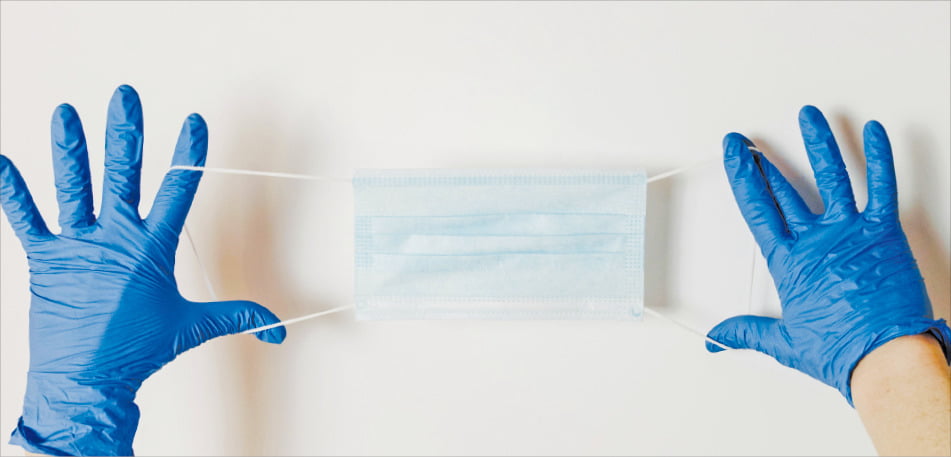
실험 결과, 토양에 KF94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0.3%일 때 예쁜꼬마선충의 번식력은 33%까지 떨어졌다. 미세플라스틱은 예쁜꼬마선충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수준을 넘어 대사 경로 자체를 교란했다. 연구팀이 대사 작용을 분석한 결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합물인 폴리아민(polyamine)의 합성을 방해해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직접 토양에 혼합했을 때는 예쁜꼬마선충의 번식력에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소제나 안정제 같은 화학첨가제가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 토양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실험 환경과 비슷한 0.1~0.3% 수준이다. 즉 실험실이 아닌 현실에서도 충분히 토양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를 이끈 김태영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태영 교수는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과 화학첨가제가 토양 생물에 미치는 생물학적 독성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며 “마스크 폐기물의 장기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마스크는 토양뿐 아니라 대기에도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다. 중국과 영국, 미국, 호주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된 일회용 마스크가 대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마스크 생산 공장의 자료를 토대로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폐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계산했다.
그 결과 마스크 1개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약 20.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으며,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마스크로 인해 총 18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마스크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전력 때문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가장 많았는데, 마스크를 만드는 것 자체보다 병원균을 차단하기 위해 작업장의 환기와 공기정화 시스템 가동에 드는 전력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마스크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서울 지역의 대기를 분석했다. 서울의 도시 숲, 상업지역, 교통시설, 비즈니스 센터에서 각각 공기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분석된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로는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이 가장 많은 59%를 차지했다.
정수종 교수는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증진 목적으로 사용한 마스크와 소독, 위생 티슈의 플라스틱 조각이 물리적 마모 과정과 태양광에 의한 광학적 분해 과정을 거쳐 대기 중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마스크와 같이 사용이 급증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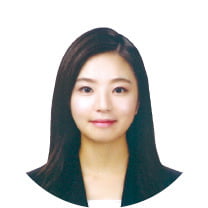

![[과학과 놀자] "나의 빨강이 곧 너의 빨강"…뇌 속의 '색깔 코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15.3.jpg)
![[과학과 놀자] "임산부에게 위험" vs "근거 없다" 팽팽](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817.3.jpg)
![[과학과 놀자] 장티푸스가 나폴레옹 군대 패퇴시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