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犧牲)'의 '희(犧)' 자는 '소 우(牛)+숨 희(羲)'의 결합으로, 제사에 쓸 희생물을 그렸다. '생(牲)'은 우(牛)와 살아있음을 뜻하는 생(生) 자가 합친 글자다. 제사 등에 바칠 살아있는 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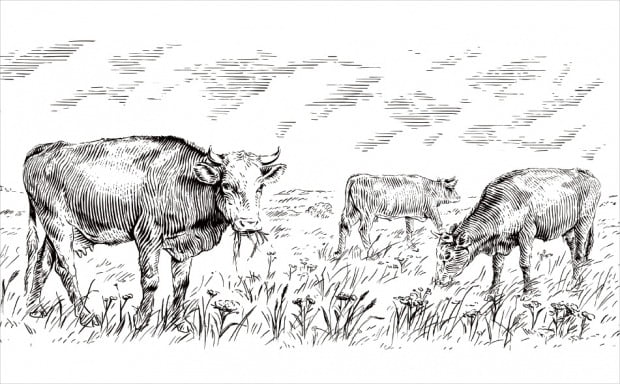
‘희생’은 이 중 ③에서 시작했다. 글자를 풀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희(犧)’ 자는 ‘소 우(牛)+숨 희(羲)’의 결합으로, 제사에 쓸 희생물을 그렸다. ‘생(牲)’은 우(牛)와 살아있음을 뜻하는 생(生) 자가 합친 글자다. 제사 등에 바칠 살아있는 소를 말한다. ‘희생물’ ‘희생양’ 같은 말에 ‘희생’의 본래 의미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서 ①의 용법이 나왔다. ‘희생번트’(타자가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해 자기는 아웃되면서 행하는 번트) ‘희생정신’(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 등을 바치는 정신) 같은 말이 그렇게 생겨났다.
②의 쓰임새가 새로 생긴 풀이다. 국립국어원은 현실언어의 쓰임새를 고려해 2014년 11월 사전에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①과 ③의 쓰임새와는 사뭇 다른 풀이다. ‘희생’과 결합한 다른 말에는 이 용법이 없는데, 유독 ‘희생자’에만 있다. 어떻게 사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 언어 인식에서 언중은 훨씬 전부터 ‘희생자’를 넓은 의미로 확대해 써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비롯해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참사는 지금도 생생하다. 전통적 용법에 익숙한 이에겐 아직 ‘어색’이런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희생자’라고 불러왔다. 2013년엔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 지진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최근엔 ‘코로나 희생자’가 익숙해졌다.
단어의 의미 확대는 흔한 일이다. 우리가 다뤄온 ‘서식지’(동물에서 동·식물로 확대)를 비롯해 ‘감투’(모자에서 벼슬로 확대) ‘수세미’(식물에서 설거지 도구로 확대)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그것이 늘 단어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토대가 허약해진다. 풀이 ①과 ③의 전통적 쓰임새에서 보듯 ‘희생’이 성립하기 위해선 ‘누구(무엇)를 위해’를 충족해야 한다. 풀이 ②는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 일각에서 이 풀이를 어색해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는 표현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조문은 죽음을 애도하며 상주를 위문하는 것이다. 상주는 빈소(시신을 모신 곳)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전통예법이다. 그러니 분향소에선 조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애도나 추모, 추도 등을 써야 ‘말의 자격’이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언어에서 이를 쓰는 까닭은 이 역시 의미 확대의 과정에 있기 때문일까?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故 이순재 선생이 남긴 우리말 숙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88040.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주차시키다, 입금시키다"의 남용과 오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56.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어색한 까닭](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7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