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어를 써야 할 곳에 무심코 관형어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관형어를 남발하면 글이 늘어져 문장에 힘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사어를 활용해야 문장에 리듬이 생기고 성분 간 연결도 긴밀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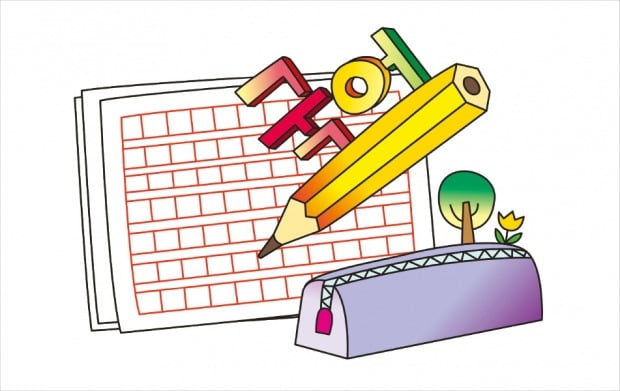
‘심심한 사과’라고 하든 ‘깊은 사과’라고 하든 서술어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가 뒤따라야 한다. 관형어 뒤엔 필수적으로 명사가 와야 해, 전체 서술부를 ‘관형어+명사+을/를+서술어’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문장 흐름을 늘어지게 한다. 부사어를 쓰면 동사가 살아나 바로 ‘부사어+서술어’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가령 ‘신중한 접근을 하다’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다’라고 하면 된다. ‘톡톡한 재미를 보다’라고 하는데, 이는 ‘톡톡히 재미 보다’라고 하면 충분하다. ‘각별히 신경 쓰다’를 ‘각별한 신경을 쓰다’ 식으로 변형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 잘못된 글쓰기 훈련 탓이다. ‘악수하다→악수를 하다, 인사하다→인사를 하다, 진입하다→진입을 하다, 조사하다→조사를 하다’ 등 몇 개 사례만 봐도 이런 유형의 함정이 얼마나 흔한지 알 수 있다.
부사어를 써야 할 곳에 무심코 관형어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문장 형식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므로 부사어로 쓰든 관형어 문구로 쓰든 비문만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관형어 문구를 남발하면 글이 늘어져 문장에 힘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사어를 활용해야 문장에 리듬이 생기고 성분 간 연결도 긴밀해진다.
정리하면 애초 발단이 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는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으면 무난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 훨씬 간결하다. 사과 의미도 도드라져 더없이 좋다. 부사어를 살려 쓰는 게 핵심이다. ‘~뜻을 밝히다’는 의미 비트는 권위적 표현통사적 용법에서 우리말을 병들게 하는 표현은 또 있다. 앞에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는 한마디로 ‘사과합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유형의, 비틀어 말하는 어법을 자주 접한다.
가령 지난해 9월 한국 개신교 성장에 큰 족적을 남긴 조용기 목사가 소천했을 때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언론에서도 그의 장례 일정을 앞다퉈 전했다. 당시 상투적으로 쓰이던 문구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 등 유력 정치인들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밝혔다.” 그냥 ‘애도했다’고 하면 간결하고 힘 있다. 이를 희한하게 ‘애도의 뜻을 밝혔다’ 식으로 쓴다. 문장 형태로는 중복이고 의미상으로도 잉여적이다. ‘애도했다’ ‘사과했다’고 하면 될 것을 ‘애도의 뜻을 전했다(밝혔다)’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식으로 비틀어 쓰는 것이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피파'를 통해 본 우리말 세 얼굴](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661241.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故 이순재 선생이 남긴 우리말 숙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88040.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주차시키다, 입금시키다"의 남용과 오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