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 시대의 유산인 '각하(閣下)'라는 말은 5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를 상징하던 대표적인 말이다.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더니 김대중 정부 들어 사실상 없어졌다. 대신 '대통령님'이 그 자리를 메웠다.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더니 김대중 정부 들어 사실상 없어졌다. 대신 '대통령님'이 그 자리를 메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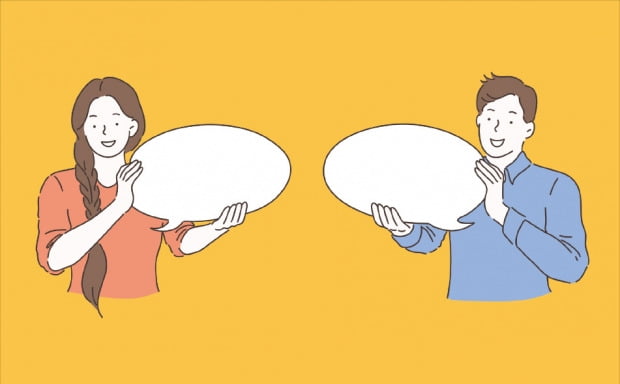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도 ‘각하’라는 용어를 버림 직하다. 그리고 ‘님’ 소리 공부도 좀 해 보아야 한다. … 이 나라의 대통령 ‘님’의 경우에도 그 딱딱한 ‘각하’ 대신에 쓰였으면 좋겠다.” 서슬 퍼런 유신 치하였던 1978년 한창기 선생(1936~1997)이 한 말이다. 자신이 발행하던 《뿌리깊은나무》를 통해서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브리태니커백과사전》으로 ‘마케팅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렇게 큰돈을 벌어서는 1970~1980년대 월간지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물》 같은 독보적인 잡지를 창간해 운영했다. 《뿌리깊은나무》는 한국에서 언론이 국한문혼용과 세로쓰기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던 시절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란 파격을 선보인, ‘대중매체의 혁명’ 그 자체였다. 그 자신도 사업가이면서 국어학자 뺨칠 정도로 우리말에 밝았고 글을 쓸 때는 문법을 철저히 따진 선각자였다.
황제의 나라에서 신하들이 황제를 가리켜 ‘폐하(陛下)’라고 했다. 그보다 낮은, 왕의 나라에선 호칭이 ‘전하(殿下)’가 되고, 그 밑 왕세자에겐 ‘저하’를 썼다. ‘각하’는 그 아래 정승들에게 붙이던 말이었다.
‘陛’가 ‘섬돌 폐’ 자다. 까마득히 높은 돌계단(陛) 위의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신하들이 하던 말이 ‘폐하’다. 전(殿)은 ‘큰집, 궁궐’을 뜻하는데, 왕이 머무르는 곳을 가리킨다. 왕이 정사(政事)를 돌보던 경복궁 근정전(勤政殿) 아래라는 뜻을 담은 부름말이 ‘전하’다. 저하(邸下)의 ‘저(邸)’는 ‘집 저’ 자다. 부수로 쓰인 우부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언덕 위의 집, 즉 마을 안에서 유력자가 사는 큰 집을 나타낸다. ‘저택’ 같은 말에 쓰인 글자다. 고유어 ‘님’ 살린 한창기 선생 혜안 돋보여각하(閣下)에 쓰인 閣은 ‘문설주 각’이다.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이 문설주다. 임진각이니 판문각이니 할 때 이 글자가 쓰였는데, 크고 높다랗게 지은 집을 가리킨다. 그러니 ‘큰집 아래’라는 뜻을 지닌 각하라는 호칭은 ‘큰집 대청마루 밑에서 우러러 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각하(閣下)’는 사전상으로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을 나타내는 말이다. 멀리 조선시대엔 정승(정일품)과 판서(정이품)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였는데, 대략 당상관(정삼품) 이상 고급관료에게 붙이던 존칭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떼어 놓은 당상’(떼어 놓은 당상이 다른 데로 갈 리 없다는 데서, 일이 확실해 틀림없음을 이르는 말.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해도 된다.)이라고 할 때의 그 당상을 말한다. 그러던 게 광복 후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과

왕조 시대의 유산인 이 말은 5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를 상징하던 대표적 말이다. ‘보통사람의 시대’를 표방한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더니 김대중 정부 들어 사실상 없어졌다. 대신 ‘대통령님’이 그 자리를 메웠다. 지금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리 부른다. 엄혹하던 시절 온갖 외압에 맞서 우리말 속 권위주의를 질타한 한창기 선생의 시대를 앞선 혜안이 새삼 돋보인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한자어인 듯 한자어 아닌 우리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63.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밥 한번 먹자" 남발해선 안되는 까닭](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09031.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접속어 '다만'의 용법 이해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2306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