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 스톡옵션
미래에 회사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열심히 일할 유인 주는 성과보상 제도
'주인·대리인 문제' 완화할 수 있어
한국에는 1997년 처음 도입
벤처업계 인재영입 수단으로 널리 쓰여
"주가 부진하면 휴짓조각 불과할 수도"
미래에 회사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열심히 일할 유인 주는 성과보상 제도
'주인·대리인 문제' 완화할 수 있어
한국에는 1997년 처음 도입
벤처업계 인재영입 수단으로 널리 쓰여
"주가 부진하면 휴짓조각 불과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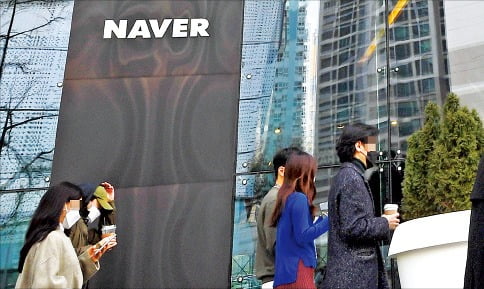
스톡옵션은 구성원에게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주는 보상으로 작용한다. 회사가 잘 돼서 상장에 성공하고 주가가 쭉쭉 오른다면 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약속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다음 시장에서 비싼 값에 되팔면 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여 월급만 받고 게을리 일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뉴스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다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반드시 대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주가가 부진하면 휴짓조각에 불과한 탓이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비싼 상황에선 주식매수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톡옵션 장점, 경제학으로 설명하면선진국에서는 스톡옵션을 통해 연봉보다 몇 배 많은 돈을 버는 최고경영자(CEO)도 흔하다. 경제학에서는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부작용을 ‘주인·대리인 문제’라 부른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댄 주인이고, 경영자는 주주를 대신해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경영자는 주주보다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늘 도사린다. 스톡옵션 부여는 양쪽의 이익을 일치시켜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기에 주가를 띄우기만 하면 거액의 보상을 챙기게 되니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수혈받거나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구설에 오른 사례가 있다. 핵심 인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줄줄이 퇴사할 가능성도 있다. 스톡옵션이 일부 직원에게만 집중될 경우 임금 격차를 벌리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한도 묶여 주식 팔 수도…코스피 상승에 '찬물'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30.3.jpg)
![[경제학 원론 산책] 금융이 민간저축을 자본재 투자로 연결시키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10.3.jpg)
![[경제야 놀자] 정부는 돈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59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