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률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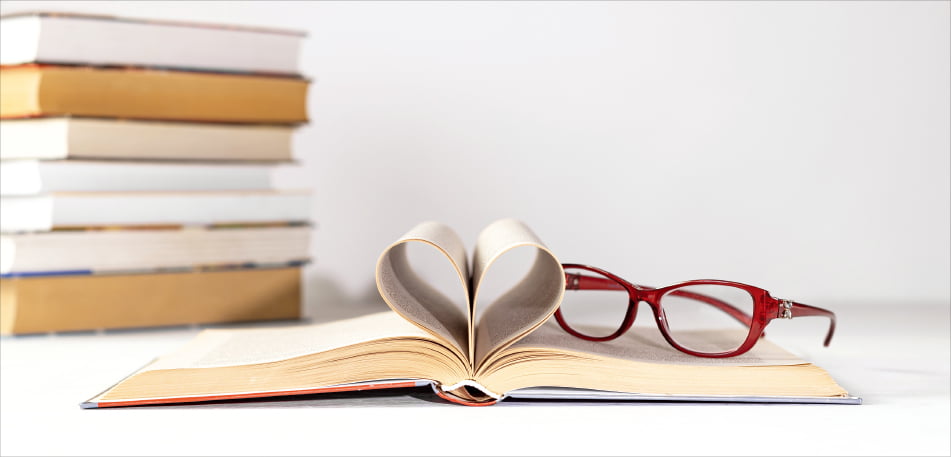
이병률 시인은 여행작가이자 출판인이며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비중 있는 책을 꾸준히 출간하면서도 ‘침대 밑에 빈 깡통 하나를 두고 동전 모으듯 시를 모으는’ 시인의 삶을 굳건히 걷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상에 나온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한국문학 분야 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한국문학의 얼굴들’ 시 분야 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2024년 한국 시 신간 베스트 1위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답 없는 시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반전·클라이맥스 소설보다 더 가슴 헤집는 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970075.1.jpg)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시들어 죽어가는 식물 앞에서 주책맞게도 배고파한 적/기차역에서 울어본 적/이 감정은 병이어서 조롱받는다 하더라도/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던 적/매일매일 햇살이 짧고 당신이 부족했던 적/이렇게 어디까지 좋아도 될까 싶어 자격을 떠올렸던 적/한 사람을 모방하고 열렬히 동의했던 적/나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조차 상실한 적/마침내 당신과 떠나간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을/영원을 붙잡았던 적”
시는 해답이 없다. 특히 이 시는 그런 적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유로움을 안긴다. 아마도 시인은 “시들어 죽어가는 식물 앞에서 주책맞게도 배고파한 적”이 있는 듯한데, 이런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시를 읽는 묘미 아닐까. 시들어 죽어가는 식물이 있을 때 배고프면 주책맞다는 마음이 드는구나, 그 섬세함에 스며드는 것이다.
밑줄을 긋고 똑같은 감정을 강요받아 외면받기도 하지만 상상이 쏟아지고, 마음이 깊어지며, 먼 나라를 다녀온 듯 아련해지기에 시가 사랑받는 것이다.
사랑을 대하는 시인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자. “나는 왜 누구의 말은 괜찮은데/누구의 말에는 죽을 것 같은가”(‘사랑’부분)라는 단 두 줄만으로도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
“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다면/두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남겨두어야 하는데/내가 이런다//너의 비밀과 나의 사랑은 연장선상에 있다/그것이다//뭐든 풀려는 내 마음이 있어 그래도 다행이지 않으냐고 말하려다/갑자기 이 모든 걸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려다/폭설처럼 친구를 안았다”(‘오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사이를 유지할 수는 없다’ 부분)는 시를 읽으면 우기고 싶고 미련한 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긴 여운을 남기는 시“사랑이 끝나고 나면/쓰레기 같은 인간과 사랑을 했구나 하고 화들짝 놀란다//그게 몇 번이었다//사랑을 하면 할수록/쓰레기보다 더한 쓰레기가 되어가는 나에게/눈발이 거세게 퍼붓고/밤하늘의 별들이 그 자리를 덮어도/쓰레기는 쓰레기로 쌓인다는 사실이/무섭고도 단조롭게 잊혀만 갔다”(‘과녁’ 부분)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보다 더한 쓰레기가 되어가는 나, 시를 읽을수록 사랑은 왜 그렇게 아프고 흔적을 남기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시인은 끝내 “사랑이 끝나면/말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 미쳐 다닌다”고 부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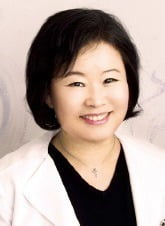
베스트셀러 여행작가인 시인이 세계를 돌며 만난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녹여낸 시가 많아 풍성함을 더한다. “사랑은 몇 발자국을 제힘으로 걸어서/저마다의 고독 속으로 미미하게 연결될 것이다”(‘그런 것처럼’ 부분)라고 전하는 시인의 깊은 마음을 만나보라.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슬픔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는 영원의 광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71.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사계절 속 서울…이방인이 포착한 우리의 삶](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09027.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갈 곳 없는 철학자가 추적했던 마지막 늑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2306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