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결함'을 지향하는 언론 기사 문장에서는 겹말 표현을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모든 언어에서 중복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허용된다. 이를 너무 배타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어색한 표현에 빠지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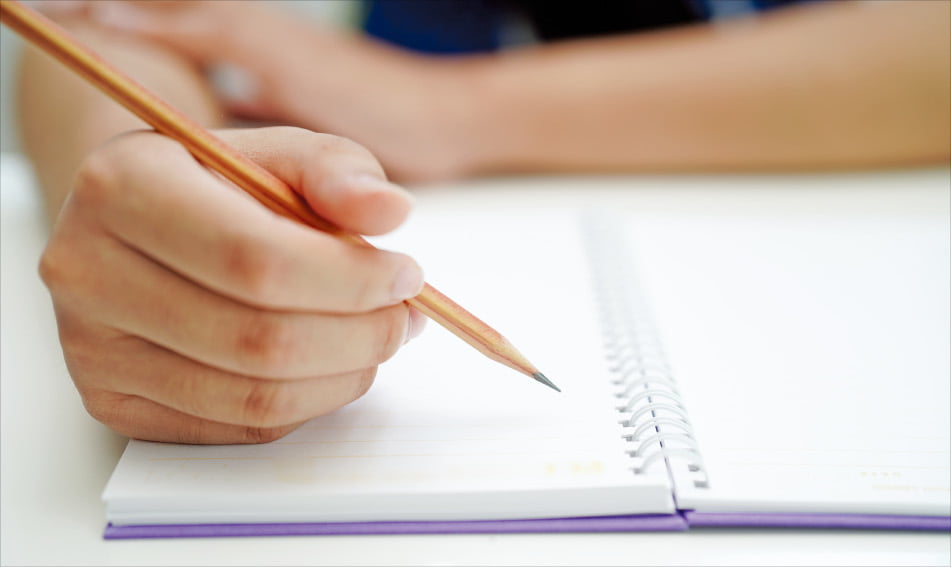
예컨대 ‘허송세월을 보내다’를 비롯해 ‘시범을 보이다’ ‘범행을 저지르다’ ‘부상을 당하다’ ‘피해를 입다’ 같은 게 모두 허용된 겹말식 표현이다. ‘시범(示範)’이 ‘모범을 보임’이란 뜻이다. 그렇다고 ‘시범을 보이다’가 중복이라 해서 ‘시범하다’라고 하면 어색하다. ‘범행’은 ‘죄를 저지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범행을 저지르다’란 용례가 올라 있다. ‘범행’을 동사로 쓸 때 ‘-하다’ 접미사를 붙여 ‘범행하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 말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상(負傷)’이 ‘상처를 입음’이란 뜻인데, ‘부상하다’는 어색하고 국어사전에 ‘부상을 입다/부상을 당하다’란 용례가 올라 있다. ‘피해(被害)’도 마찬가지다. ‘피해’가 ‘손해를 입음’이다. 그래서 ‘피해하다’란 말은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어색하고 사전에는 ‘피해를 입다’ ‘피해를 당하다’가 용례로 올라 있다.
‘범행하다, 피해하다, 시범하다, 부상하다’처럼 쓰기보다는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를 입다/당하다, 시범을 보이다, 부상당하다’와 같이 쓰는 게 언어 현실이다. 국어사전의 용례는 이런 현실적 쓰임새를 반영한 것이다. 심층구조 속 중복 표현도 많아잉여적 표현의 끝에는 심층구조에서의 ‘중복’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살펴본 중복 표현의 사례보다 알아채기가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문장의 표면 구조에선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심층적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 다음 예문이 그런 사례다.
“모든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여의도와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와 조망권이 뛰어나다.” 이 문장은 세 개의 정보를 담고 있다. ① 모든 가구가 남향이다. ② 여의도와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③ 조망권이 뛰어나다. 이 세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돼 문장을 구성했다. 골자는 ‘~으로 배치돼 ~이 어떠하다’이다.
예문에서는 ‘어떠하다’ 부분에 ‘여의도와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정보와 ‘조망권이 뛰어나다’라는 정보가 부사어(‘들어와’)로 연결돼 있다. 이때 의미상 ‘한눈에 들어온다=조망권이 뛰어나다’는 동어반복이다. ②와 ③이 사실상 같은 말인 셈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모든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여의도와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로 충분한 표현이다. 또는 ‘조망권’ 표현을 살리고 싶다면, ‘모든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여의도와 관악산 조망권이 뛰어나다’와 같이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쓰면 간결함을 최대한 살린 표현이 된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접속어 '다만'의 용법 이해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230627.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주차용량 200본' vs '주차용량 200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148425.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범죄 경력'과 '온난화 기여'의 어색함](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06979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