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파트릭 모디아노 <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낱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첫 문장에 매료되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속으로 빨려들면 오묘한 미로 속에서 수많은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 모호하면서도 매혹적인 장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트가 운영하는 흥신소에서 탐정 일을 하는 기 롤랑.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기 롤랑이라는 이름과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준 위트는 “지금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시오”라는 현실적 조언까지 한다. 8년간 함께 일한 위트가 흥신소 문을 닫자 롤랑은 늘 허전한 현재와 기대되지 않는 미래가 아닌 깜깜한 과거로 떠난다.
‘흥신소’와 ‘탐정’이 추적을 좁혀가며 과거를 선명하게 복원해 낼 것이라는 기대를 주지만,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제목처럼 기 롤랑이 떠나는 길은 불확실하기 그지없다.
파트릭 모디아노는 1945년 프랑스 불로뉴비양쿠르에서 이탈리아계 유대인 아버지와 벨기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3세에 발표한 첫 소설로 두 개의 상을 받은 그는 이후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평단과 독자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으며 유명 문학상을 휩쓸었다. 주요 작품으로 <도라 브루더> <신원 미상 여자> <작은 보석> <한밤의 사고> <혈통>을 꼽는데,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현대 프랑스 문학이 거두어들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슬픈 빌라><청춘시절><8월의 일요일들><잃어버린 대학>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노벨 문학상·공쿠르상·부커상을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는데, 모디아노는 33세에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공쿠르상, 69세 때인 2014년에는 노벨상을 받았다. 기억의 퍼즐을 맞추다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희미해서 더욱 간절한 그 시절의 매혹](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401917.1.jpg)
말 한마디에서 단서를 얻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습득한 사진을 보며 퍼즐을 맞춰가던 중 “내 속에서 무엇인가 털컥하고 걸리는 듯한 느낌”과 “어떤 인상이 번뜩 머리를 스쳐 지나면서”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한 번도 그 페드로 맥케부아였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라고 중얼거린다.
“모두가 므제브로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조각조각 기억 속에 되살아난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므제브의 산장 남십자성에서 함께 묵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여자 친구 드니즈까지 떠오른다. 기억은 프랑스 국경을 넘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돈을 건넨 페드로가 드니즈와 함께 떠나지만 배신당하고 팽개쳐지는 아픔까지 이어진다. 그 순간 기 롤랑인지 페드로인지 모를 주인공은 다시 모호함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도무지 붙잡히지 않는 꿈의 조각들그 후에도 기억 속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은 죽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 주소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2번지’에 가기로 한 주인공은 사진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소설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계속해서 더 놀고 싶었기 때문에 울고 있다. 그 소녀는 멀어져 간다. 그녀는 벌써 길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또한 그 어린아이의 슬픔과 마찬가지로 저녁 속으로 빨리 지워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로 끝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이 오래 머물게 된다.
1945년생인 모디아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과거를 상실한 세대의 기억을 형상화한 대표적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소설은 대개 ‘바스러지는 과거, 잃어버린 삶의 흔적, 악몽의 어둠 속에 파묻힌 대전(大戰)의 경험’을 주제로 기억 상실자가 자신의 구멍 뚫린 과거를 찾아 헤매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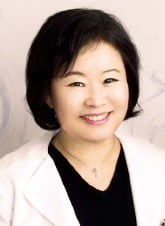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실명…"죽을 용기로 살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88048.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첫째가 건강, 둘째는 재능"…하루키의 좌우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54.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마음 저미는 저주받은 자의 비뚤어진 사랑](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78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