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아베 코보 < 모래의 여자 >
<모래의 여자>를 읽는 동안 ‘하늘이 암갈색으로 물들고 흙먼지가 풀풀 일어 숨 막힐 것 같은’ 기분에 빠질 수 있다. 절체절명의 수렁에 갇힌 남자의 절규를 따라가면서 그 심리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아베 코보는 <뉴욕타임스> 선정 세계 10대 문제 작가에 꼽혔으며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적인 작가로 평가받았다. 1924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으나 이듬해부터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만주에서 살았다. 아베 코보는 수필집 <사막의 사상>에서 ‘사막적인 것에는 늘 뭐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며 ‘거의 사막과도 같은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막을 동경했던 것 같다’는 심경을 밝혔다. ‘바짝 마른 눈두덩이 속으로 모래가 파고드는 짜증스러운 기분 이면에는 불쾌함이 아니라 일종의 들뜬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상반된 감정이 이 소설을 쓰게 했을 것이다.
20개 언어로 번역된 이 작품은 1963년 요미우리 문학상, 1968년 프랑스 최우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64년 영화화돼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모래 구덩이 집에 갇히다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일상의 반복에 갇힌 그 남자의 심리가 궁금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969058.1.jpg)
남자는 반달 모양으로 우뚝 솟아 성벽처럼 부락을 둘러싸고 있는 사구의 능선을 따라 걷다가 깊은 구멍이 내려다보이는 벼랑 끝에 도달한다. 날은 어두웠고 버스는 끊어진 상황에서 마을 노인의 권유로 어떤 집에 머물게 된다. 지붕 높이의 세 배에 달하는 벼랑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이상한 집이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그 집에서 46일을 갇혀 지내게 된다. 바다에 접해 있는 열몇 채의 집이 가림막 구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집에 갇힌 것이다. 얼마 전 모래폭풍으로 남편과 아이가 죽어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다. 불어오는 모래를 계속 퍼내려면 젊은 남자가 필요한데 곤충을 잡겠다고 제 발로 걸어온 남자를 마을 노인이 구덩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갖은 시도 끝에 밖으로 나오지만 개를 앞세우고 따라오는 마을 주민들의 계략에 빠져 모래 구덩이에 빠진 남자는 결국 질질 끌려 모래집으로 되돌아온다. ‘모래에 침식되어 일상적인 약속 따위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특별한 세계’에서 남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모래가 고체면서도 유체역학적인 성질을 다분히 갖고 있다는 점’ 정도다. ‘세계는 모래 같은 것이 아닐까. 모래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모래가 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유동 자체가 모래’ 같은 수려한 문장들이 소설 내내 이어진다.
관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부락 전체가 송두리째 모래 속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 일부 주민과 외부 사람을 혹사시키는 부락민들, 끊임없이 모래를 퍼내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가 내내 의문을 들게 한다. 도망가지 않는 남자다시 모래 구덩이에 팽개쳐진 남자의 중얼거림이 답을 말해주는 듯하다. “어차피 인생이란 거 일일이 납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 그래서 어쩔 거냐는 생각이 가장 견딜 수 없어.”
이어지는 ‘아무런 기약 없이 그저 기다림에 길들어, 겨울잠의 계절이 끝났는데도 눈이 부셔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걸도 사흘을 계속하면 그만두기 어렵다’는 문장이 일상에 젖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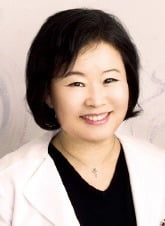
그토록 탈출을 염원했던 남자는 시지프스처럼 모래 치우기에 익숙해진 걸까? 답답하면서도 일상과 연관된 생각을 마구 피어오르게 만드는 소설이다.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실명…"죽을 용기로 살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88048.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첫째가 건강, 둘째는 재능"…하루키의 좌우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54.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마음 저미는 저주받은 자의 비뚤어진 사랑](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78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