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안나 가발다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이 책은 프랑스 작가 안나 가발다가 29세이던 1999년에 출간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99부를 발간한 걸 보면 무명 작가의 첫 작품집에 큰 확신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장편소설만 우대하고 단편은 습작 정도로 여기는 프랑스 문학 풍토에서 이 책은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70만 부나 팔려나갔다. 언론과 문단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는 독자들의 고백이 이어지며 판매량이 올라간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간될 때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는 전 세계 40개국에 판권이 팔린 가운데 190만 부가 판매되었다. 내 이야기도 소설로 만들 수 있겠다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소설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는 독자들 고백 이어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314579.1.jpg)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면’에 수록된 다섯 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생제르맹데프레의 연인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출판사 여직원이다. 거리에서 운명적인 느낌의 남자와 마주치자 미소를 날린 뒤 무심한 척 지나친다. 저녁을 함께하자는 그 남자의 제안에 다시 만난 그녀는 그 남자의 태도와 옷차림을 훔쳐보며 점점 빠져든다. 하지만 남자가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에 신경 쓰는 걸 보고 미련 없이 돌아선다.
‘앙브르’는 순회공연을 하느라 늘 피곤한 남자의 이야기다. 프리랜스 사진가 앙브르는 그 남자의 순회공연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앙브르가 그 남자에게 내민 사진에는 “샛강 같은 정맥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야위고 커다란 손”뿐이었다. 앙브르는 왜 손만 찍었고, 그 남자는 왜 “내 심장은요?” 하고 묻는 것일까.
‘휴가’는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휴가 나온 병사의 이야기다. 자신의 자리를 엉뚱한 아줌마가 차지하는 바람에 남의 자리에 엉거주춤 앉아서 온 그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힘이 빠져 깜깜한 집의 문을 열자 ‘생일 축가’ 노래와 함께 불이 켜진다. 그 자리에 열 살 때 여름 캠프에 같이 갔던 마리가 와 있다. 두 사람의 추억에 대해 마리가 질문하지만 그는 짐짓 모른 체한다. 일반 사병인 그와 달리 늘 자신만만한 학군장교 동생도 마리를 마음에 들어 한다. 추억은 힘이 센 법, 아무래도 그와 마리가 맺어질 듯하다.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다채롭다‘그 후로도 오랫동안’의 주인공은 스물여섯에 여자와 헤어졌다. 유일한 사랑이었던 그녀는 그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후 얼떨결에 결혼한 그는 계속 아내에게 상처만 주다가 방황을 그치고 행복하게 산다. 아이 셋을 낳고 사업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12년 만에 헤어진 그녀로부터 연락이 온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그녀. ‘제 영혼의 일부가 죽는 게 슬프면서도 그녀가 죽는 게 슬픈 것처럼 착각할까’ 두려운 그, 과연 그녀를 만날까.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뜨거웠던 사랑이 오늘의 행복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할 포인트가 많은 작품이다.
‘클릭클락’은 다섯 달 보름째 판매 주임 사라 브리오에게 사랑을 느끼는 남자가 두 명의 누이와 한집에서 복닥거리며 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사라 브리오에게 선물하려던 속옷을 들킨 그는 결국 독립하고, 작고 복잡한 집으로 사라 브리오가 햇살처럼 눈부신 모습으로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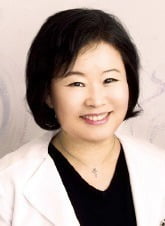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마음 저미는 저주받은 자의 비뚤어진 사랑](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783.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슬픔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는 영원의 광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76071.3.jpg)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사계절 속 서울…이방인이 포착한 우리의 삶](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090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