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내가 만난 운명의 Book
(41) 에이먼 버틀러의 공공선택론 입문(상)
필자는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책, ‘Public Choice:A Primer’를 보고 “이것을 번역해 국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내 IEA에 편지를 썼고, 고맙게도 관대한 조건으로 번역권을 얻었으며, 2013년 3월 한국어로 출판했다.(41) 에이먼 버틀러의 공공선택론 입문(상)
2013년 한국어로 출간
![[Books In Life] 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왜 비슷한가…정부는 왜 커지고 비효율적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AA.10766284.1.jpg)
필자가 번역한 다른 두 권의 책을 보완해서 읽으면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고든 털럭이 공공선택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역시 IEA에서 간행된 ‘득표 동기론(The Vote Motive)’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미시간대 출판부에서 낸 공공선택론의 고전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이다.
거짓 주장에 감염 안 되려면
필자는 국민이 사회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공공선택론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사회적 선택을 내리면 그것은 사회에 심대한 외부 비용을 끼칠 수 있다. 잘못된 주장에 감염되지 않도록 맞는 예방 주사 혹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는 해독제의 역할을 공공선택론 지식이 수행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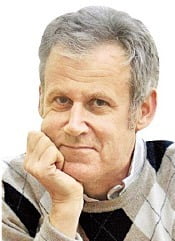
공공선택론은 정치 행정 현상을 분석하는 데 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시장 경제 이론에서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듯이, 공공선택론은 투표자, 정치가, 관료, 정당원, 이익 집단 구성원 등 공공 행위 주체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많은 사람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단일의 공익은 없다는 것, 다양한 자기 이익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 공익이 있다면 개인 이익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은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이 꼭 같다고 불평한다. 그런 불평은 이해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정당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최대한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 양당 제도의 경우, 정당은 중도의 정강 정책을 제시해야 중위 투표자의 지지를 얻고 따라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3당 체제에서는 정당들 사이에서 정강 정책이 괴리를 보이는데, 물론 이 점도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포퓰리즘 해설서
![[Books In Life] 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왜 비슷한가…정부는 왜 커지고 비효율적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AA.10766300.1.jpg)
사람들은 한 지역에 두 개의 경찰서를 두는 것을 중복이고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동차를 여러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복이고 낭비인가? 우리는 이것을 중복이고 낭비라고 부르지 않고 경쟁이고 효율이라고 부른다. 같은 논리로 공공선택론은 관료제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여러 관료 기관들이 중첩해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관료 기관들의 서비스를 비교 평가해 선택할 수 있고, 관료 기관들은 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이익집단은 추구하는 공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조직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이익들은 저절로 조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책은 설명한다. 집단이 추구하는 공통 이익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통 이익 추구에 무임승차하려 한다.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특별히 강제나 선택적 유인 같은 사적재(私的財·private goods)가 제공되어야 집단이 조직되고, 그렇지 않은 이익 집단은 잘 조직되지 않는다. 소비자 집단과 납세자 집단이 잘 조직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집단의 규모가 크면 이익 집단으로 조직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더 심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단은 소규모 집단보다 조직하기 더 어렵다. 반면 소규모 집단은 사회적 압력과 같은 무임승차 억제 장치가 있어서 대규모 집단보다 조직하기 더 쉽다. 또한 이익 다툼에서 소규모 집단은 집중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규모 집단은 분산된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보다 조직하기 더 쉽다. 작은 것이 강하다!
이익집단을 알자

이 책을 읽으면 정부가 크고 규제 권력이 클 때 개인도 가난해지고 국가도 가난해짐을 알게 된다. 정부가 민간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이익 집단들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려 하기보다 정치 과정을 통해 특권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회사 사장이 지방 공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가 있게 된다. 이런 지대 추구 활동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됐어야 할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여 자원이 낭비된다. 그 결과 개인과 국가가 가난해진다.
황수연 <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

![천년을 하루같이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88075.3.jpg)
!['실낙원'의 밀턴이 눈 멀고 쓴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14041.3.jpg)
!['바람'과 '사람'과 '꽃 그림자'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4778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