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신간 - 원더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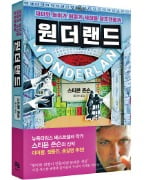
《로빈슨 크루소》를 쓴 영국 소설가 대니얼 디포는 1727년 런던의 상점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상점 주인들은 ‘근대 산업혁명을 촉발한 주역’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17세기 말부터 들어선 고급 상점들은 사고팔 것이 있어야 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아이 쇼핑’을 위해 가게를 찾게 만들었다. 이들 상점에 진열된 품목 중엔 면직물도 있었다. 1498년 유럽에 처음 들어온 면직물은 2세기 가까이 대중적으로 유통되지 못했지만, 고급 상점의 등장으로 상황이 변했다.
숙녀들의 마음을 빼앗은 면직물이 대대적으로 유행했고, 면직물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방적기 등을 잇달아 발명했다.
미국의 과학저술가 스티븐 존슨은 신간 《원더랜드》(프런티어 펴냄·444쪽·1만6000원)에서 인류 역사의 혁신은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한다. 이 책의 부제는 ‘재미와 놀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찮아 보일지라도 즐거움을 주는 대상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이것이 상업화 시도와 신기술 개발,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니게 될 중요한 의미를 과소평가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것들은 낯설고, 삶에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장 도움이 되지 않기에 무시되곤 한다. 그러나 색다름을 추구하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공간과 장치들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명을 추구할 발판으로 삼는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정기예금·수익증권 등 4500조…5년 전보다 50%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729886.3.jpg)
![[경제학 원론 산책] '금융 안정 → 규제 완화 → 부실 증가 → 위기' 반복](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729881.3.jpg)
![[경제야 놀자] '취향 저격' 어려운 선물…차라리 현금이 낫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7298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