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어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사전이 알려주는 것들 (1)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엄혹한 우리말 탄압 속에서 국어학자 문세영이 《조선어사전》을 펴냈다. 10만여 어휘를 다룬 이 사전은 한국인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요즘, 우리말에 대한 인식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웹사전이 나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건도 갖춰졌다. 단어 용법 등 사전엔 수많은 정보 담겨하지만 정작 사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끌어-올리다’는 띄어 쓰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의외로 이런 독자 질문에 자주 부딪친다. 이를 비롯해 ‘바른길, 하루걸러, 참다못하다’ 같은 무수한 합성어류는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더 의존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이 ‘바른-길, 하루-걸러, 참다-못하다’ 식으로 나온다. 사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를 띄어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사전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대부분 표제어를 확인하고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사전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 품사 정보는 기본이고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즉 용법을 비롯해 관용구·속담, 어원, 결합구조 등 우리말에 관한 수많은 내용이 집약돼 있다. 그래서 사전을 ‘우리말의 보고(寶庫)’라고 하는 것이다.사전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부호’를 알아야 한다. ‘끌어-올리다’에 쓰인 붙임표(-)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쓴 여러 부호 중 하나다. 사전의 앞쪽 ‘일러두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깜깜이' 톺아보기
코로나19가 한창 재확산하던 지난 8월 3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조금은 ‘뜬금없이’ 들릴지 모를 얘기를 꺼냈다. “‘깜깜이 감염’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경로 불명’을 대체어로 제시했다. ‘깜깜이’는 사전에 없는, 의미확장 중인 단어코로나19는 우리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줬다. 그중 하나가 이날 발언으로 새삼 부각된 ‘우리말 속 차별어’ 논란이다.‘깜깜이’는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정식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이 언중 사이에 알려진 게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올라 있다. 나중에 조건이 충족되면 단어가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다는 얘기다.‘깜깜이’는 주로 언론에서 써온 말이다. ‘깜깜이 선거, 깜깜이 분양, 깜깜이 입찰, 깜깜이 리포트, 깜깜이 심사’ 등 비유적 표현에 사용됐다.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 ‘깜깜하다’에서 생성됐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깜깜하다’란 말은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에서 쓰일까? 이게 차별어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깜깜하다’는 ‘어떤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잊은 상태이다’란 뜻이다. “나는 음악에 깜깜해”라고 하면 음악에 관해 아는 게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파생어 ‘깜깜이’가 나왔다. 어근 ‘깜깜’에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발열'의 발음은 [바렬]? [발렬]?
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는 우리 국어생활에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그중에 ‘발열’은 발음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이 말을 사람마다 [발녈] [발렬] [바렬] 식으로 들쭉날쭉 발음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만큼 수시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솜이불’ 등 합성어에서 ‘ㄴ’음 첨가돼 발음이 말은 ‘발(發)+열(熱)’의 구조다. ‘열이 남(또는 열을 냄)’이란 뜻이다.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구의 구조였으나 우리말 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단어로 굳은 말이다. 그 발음은 [바렬]이라고 해야 맞다. 받침이 밑으로 흘러내린다.‘발열’의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ㄴ’ 첨가 현상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표준발음법(제29항)에서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뒷말 모음에 ‘ㄴ’ 음을 첨가해 발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살피면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 음으로 시작하면 ‘ㄴ’ 음이 덧난다”는 얘기다. ‘동-영상[동녕상], 솜-이불[솜니불], 막-일[망닐], 내복-약[내봉냑], 색-연필[생년필], 늑막-염[능망념], 영업-용[영엄뇽], 식용-유[시?뉴], 백분-율[백뿐뉼]’ 같은 게 그 예다.이런 규정은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발음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가 작용한 결과다. 요즘은 발음 교육이 부실한 탓인지 이들을 발음할 때 ‘ㄴ’ 음 첨가 없이 [동영상, 소미불, 마길, 내보갹, 새견필, 능마겸, 영어?, 시?유, 백뿌뉼] 식으로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받침을 흘러내려 발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선물 받다'는 띄어쓰고 '미움받다'는 붙여써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더 좋다. 이 즈음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연말 의미를 더한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 곧 이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한다. 이때의 ‘받다’는 물론 동사다. 그런데 이 말은 접미사로도 쓰여 우리말에 부족한 동사를 풍성하게 생성한다. 파생어들이다.피동 뜻 더하면 접미사 용법이라 붙여 써접사는 독립성이 없어 언제나 어근에 붙여 쓰는 말이다. 문제는 ‘받다’가 동사와 접미사 양쪽으로 쓰이다 보니 이들의 띄어쓰기가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앞에서 본 예만 해도 가운데 낀 조사와 부사를 생략하고 쓸 때 “선물받았다” “복받으세요”처럼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선물 받았다” “복 받으세요”라고 띄어 써야 할까? 답부터 말하면 이들은 띄어 써야 맞는 말이다. 아무 말에나 ‘받다’가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세금 받다/편지 받다/월급 받다’와 ‘귀염받다/벌받다/주목받다’ 등 …. 이들을 구별해야 한다. ‘받다’와 어울리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을 띄어 쓰고, 어떤 것을 붙여 쓸까?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 앞의 경우는 ‘받다’를 동사로 보고, 뒤의 경우에는 접미사로 보기 때문이다.접미사 ‘받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그 말을 동사로 만드는 구실을 한다. 그러니 동사인지 접미사인지를 가르는 핵심은 당연히 ‘피동성’ 여부에 있다. 피동성을 판별하는 요체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당하다, 입다’란 의미를 띠는지를 살피는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잘 살다'는 '잘 지내다', '잘살다'는 '부유하다'는 뜻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1970년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록적 경제 발전 뒤에는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노래가 있었다. 새마을운동 하면 떠오르는 이 노래 ‘잘살아 보세’가 그것이다. 전국 어디를 가든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잘살아’ 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못살다’는 합성어…‘가난하다’란 뜻 담아요즘은 잊혀가는 이 노래를 새삼 끄집어낸 까닭은 노래 제목에 띄어쓰기의 요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무수한 합성어와 파생어들의 구별에 있다. 어떤 말이 합성어인지 혹은 파생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띄어 쓰든 말든 할 것이다. ‘잘살다’와 ‘잘 살다’, ‘못살다’와 ‘못 살다’의 구별은 글쓰기에서 누구나 부딪치는 곤혹스러운 문제다.우선 ‘잘 살다’와 ‘잘살다’를 어떻게 구별할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잘 살고 있다.” “병이 깊어 잘 살아봐야 1년이다.” 이런 데 쓰인 ‘잘 살다’는 잘 지낸다는 뜻이다. ‘살아가는 방식(행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비해 ‘잘살다’는 재물이 많다, 즉 부유하게 산다는 뜻이다. ‘잘’과 ‘살다’가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합성어로 볼지, 구의 구조로 볼지를 판단하는 요령 중 하나는 ‘단어끼리 어울려 무언가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보릿고개 시절에도 잘사는 집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처럼 쓴다.같은 방식으로 ‘못살다’와 ‘못 살다’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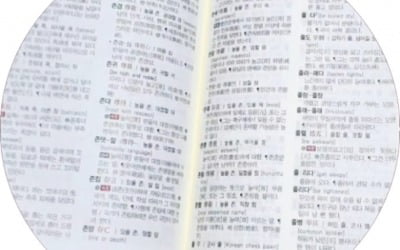

!['발열'의 발음은 [바렬]? [발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AA.2314879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