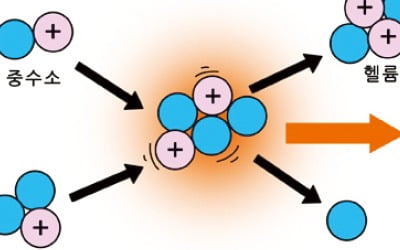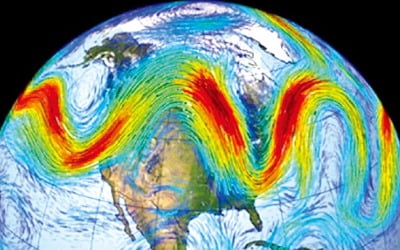지구궤도 떠도는 인공위성 잔해·파편 등 골칫거리로
![[Science] 우주를 떠도는 쓰레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0911/2009112552201_2009112721791.jpg)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산다.
정작 버리면서도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걸까?
답은 태워지거나 묻히거나 아니면 바다에 뿌려진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가 우주를 떠돌고 있다면 어떨까?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에 머리를 다칠지도 모른다.
현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달만이 아니다.
우선 약 800여기의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를 돌면서 통신이나 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래 약 6000여기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려졌고 국제우주정거장(ISS)도 건설되고 있다.
한국도 무궁화, 아리랑, 우리별 등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 2002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아마추어 천문가는 최대 크기 50m 정도로 추정되고 지구 주위를 50일 주기로 공전하는 흥미로운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 물체는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J002E2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당시 영국 BBC방송은 지구를 도는 새로운 위성일지 모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J002E2는 1969년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2호의 잔해로 판명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아폴로 12호를 실은 새턴V 로켓에서 분리된 3단 연료통이 오랫동안 태양 주위를 돌다가 지구를 도는 궤도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우주쓰레기다.
⊙ 우주쓰레기는 무엇일까? 처리방법은?
대형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은 수명이 다하면 우주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구에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2월 수장된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 미르이다.
러시아는 1986년 미르를 발사해 15년 동안 지구를 돌게 한 뒤 천천히 태평양으로 떨어뜨렸다.
대형 인공위성 역시 수명을 다하면 지구로 떨어뜨려 바다에 수장시키거나 대기권 속에서 공기 마찰을 통해 불태워 버린다.
문제는 모든 위성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성에 역추진 로켓을 달아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마찰열로 태워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우주환경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받는 면과 그 반대편의 온도 차가 극심하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면의 온도는 영상 120도이고 그늘 쪽은 영하 180도에 달한다.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앞뒤 면이 번갈아 가면서 태양을 보도록 하거나 냉각파이프를 이용해 온도를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양쪽 면의 극심한 온도 차이 때문에 위성이 깨져버리고 배터리나 남아 있는 추진체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주 쓰레기가 되는데 우주쓰레기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파편들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우주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잔해뿐만이 아니다.
위성발사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로켓의 상단 동체 부분, 로켓과 인공위성을 분리할 때 발생한 파편이나 페인트 조각 등 다양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쓰레기만 해도 크기가 10㎝ 이상인 것이 7000개, 1~10㎝ 크기 1만7500개, 0.1~1㎝ 크기 350만개 이상이 지구궤도에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큰 쓰레기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커다란 파편들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가 가능해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
실제로 미국의 우주정찰네트워크(SSN)는 10㎝ 이상 크기의 우주 물체 약 1만3000개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문제는 1㎝ 정도의 작은 물체들이다.
주로 로켓이나 인공위성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부품, 페인트 부스러기 등 작은 우주 쓰레기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고 심하면 여러가지로 땅 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작은 크기의 우주쓰레기가 더 무섭다
작은 크기의 우주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원래 인공위성은 초속 7~8㎞의 엄청난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그래야 지구의 중력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성이 폭발하게 되면 파편들은 기존 속도에 힘을 받아 파편들의 운동속도가 초속 1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파편들은 지름 1㎝만 되어도 시속 100㎞의 속도로 200㎏의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력을 갖게 된다.
다시말해 지름이 10㎝ 정도가 된다면 다이너마이트 25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파편들에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대형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파괴돼 버린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공위성의 기능이 손상될 정도의 충돌 사고는 없었다.
지난해 사이언스지 발표에 따르면 우주쓰레기의 대부분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고도 800~1000㎞에 몰려 있다.
고도 350㎞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나 400㎞~600㎞에서 비행하는 유인우주왕복선에는 당장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ISS의 경우 지상 레이더로 '쓰레기 더미'가 가까이 다가올 조짐이 관찰되면 ISS의 고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2003년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의 원인이 우주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우주쓰레기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위성이나 우주왕복선을 띄울 때는 우주쓰레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1년 스페이스 셔틀은 러시아의 코스모스 인공위성 부품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7초 동안 긴급 엔진가동을 수행한적이 있다.
또 각국의 우주기구들이 우주 탐사선을 발사할 때마다 반드시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방호 뚜껑을 씌우고 우주 쓰레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코스로 비행경로를 잡는다.
우주쓰레기의 또 다른 문제는 지구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주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이런 우주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주개발에 나선 국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문제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NASA(미국항공우주국)의 자료를 보면 고도 800㎞에 떠 있는 1~10㎝ 길이의 쓰레기를 지상 레이저포로 없애려면 2년간 무려 8000만달러(약 800억원)를 써야한다고 한다.
게다가 10㎝ 이상의 쓰레기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는 것.
골칫거리가 되어가는 우주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치우는 것이 더 힘들다는 단순한 진리가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다.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과학향기)
임기훈 한국경제신문기자 shagger@hankyung.com
![[Science] 우주를 떠도는 쓰레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0911/2009112552201_2009112721791.jpg)
정작 버리면서도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걸까?
답은 태워지거나 묻히거나 아니면 바다에 뿌려진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가 우주를 떠돌고 있다면 어떨까?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에 머리를 다칠지도 모른다.
현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달만이 아니다.
우선 약 800여기의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를 돌면서 통신이나 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래 약 6000여기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려졌고 국제우주정거장(ISS)도 건설되고 있다.
한국도 무궁화, 아리랑, 우리별 등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 2002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아마추어 천문가는 최대 크기 50m 정도로 추정되고 지구 주위를 50일 주기로 공전하는 흥미로운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 물체는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J002E2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당시 영국 BBC방송은 지구를 도는 새로운 위성일지 모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J002E2는 1969년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2호의 잔해로 판명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아폴로 12호를 실은 새턴V 로켓에서 분리된 3단 연료통이 오랫동안 태양 주위를 돌다가 지구를 도는 궤도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우주쓰레기다.
⊙ 우주쓰레기는 무엇일까? 처리방법은?
대형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은 수명이 다하면 우주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구에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2월 수장된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 미르이다.
러시아는 1986년 미르를 발사해 15년 동안 지구를 돌게 한 뒤 천천히 태평양으로 떨어뜨렸다.
대형 인공위성 역시 수명을 다하면 지구로 떨어뜨려 바다에 수장시키거나 대기권 속에서 공기 마찰을 통해 불태워 버린다.
문제는 모든 위성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성에 역추진 로켓을 달아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마찰열로 태워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우주환경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받는 면과 그 반대편의 온도 차가 극심하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면의 온도는 영상 120도이고 그늘 쪽은 영하 180도에 달한다.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앞뒤 면이 번갈아 가면서 태양을 보도록 하거나 냉각파이프를 이용해 온도를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양쪽 면의 극심한 온도 차이 때문에 위성이 깨져버리고 배터리나 남아 있는 추진체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주 쓰레기가 되는데 우주쓰레기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파편들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우주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잔해뿐만이 아니다.
위성발사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로켓의 상단 동체 부분, 로켓과 인공위성을 분리할 때 발생한 파편이나 페인트 조각 등 다양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쓰레기만 해도 크기가 10㎝ 이상인 것이 7000개, 1~10㎝ 크기 1만7500개, 0.1~1㎝ 크기 350만개 이상이 지구궤도에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큰 쓰레기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커다란 파편들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가 가능해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
실제로 미국의 우주정찰네트워크(SSN)는 10㎝ 이상 크기의 우주 물체 약 1만3000개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문제는 1㎝ 정도의 작은 물체들이다.
주로 로켓이나 인공위성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부품, 페인트 부스러기 등 작은 우주 쓰레기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고 심하면 여러가지로 땅 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작은 크기의 우주쓰레기가 더 무섭다
작은 크기의 우주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원래 인공위성은 초속 7~8㎞의 엄청난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그래야 지구의 중력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성이 폭발하게 되면 파편들은 기존 속도에 힘을 받아 파편들의 운동속도가 초속 1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파편들은 지름 1㎝만 되어도 시속 100㎞의 속도로 200㎏의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력을 갖게 된다.
다시말해 지름이 10㎝ 정도가 된다면 다이너마이트 25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파편들에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대형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파괴돼 버린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공위성의 기능이 손상될 정도의 충돌 사고는 없었다.
지난해 사이언스지 발표에 따르면 우주쓰레기의 대부분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고도 800~1000㎞에 몰려 있다.
고도 350㎞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나 400㎞~600㎞에서 비행하는 유인우주왕복선에는 당장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ISS의 경우 지상 레이더로 '쓰레기 더미'가 가까이 다가올 조짐이 관찰되면 ISS의 고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2003년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의 원인이 우주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우주쓰레기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위성이나 우주왕복선을 띄울 때는 우주쓰레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1년 스페이스 셔틀은 러시아의 코스모스 인공위성 부품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7초 동안 긴급 엔진가동을 수행한적이 있다.
또 각국의 우주기구들이 우주 탐사선을 발사할 때마다 반드시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방호 뚜껑을 씌우고 우주 쓰레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코스로 비행경로를 잡는다.
우주쓰레기의 또 다른 문제는 지구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주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이런 우주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주개발에 나선 국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문제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NASA(미국항공우주국)의 자료를 보면 고도 800㎞에 떠 있는 1~10㎝ 길이의 쓰레기를 지상 레이저포로 없애려면 2년간 무려 8000만달러(약 800억원)를 써야한다고 한다.
게다가 10㎝ 이상의 쓰레기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는 것.
골칫거리가 되어가는 우주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치우는 것이 더 힘들다는 단순한 진리가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다.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과학향기)
임기훈 한국경제신문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