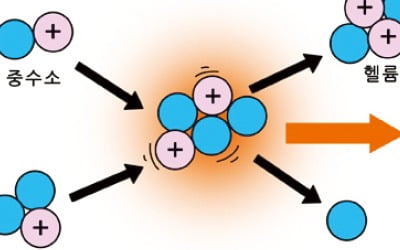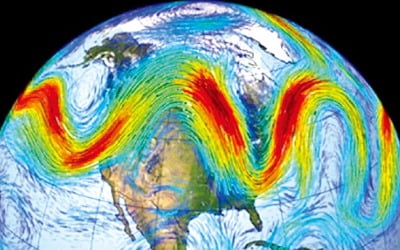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약품의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치료제인 '플라빅스'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와 이 회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가 그 주인공.분쟁의 핵심은 사노피아벤티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가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 여부다.
보통 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그 제품을 모방한 제네릭 약품을 만들수 있다.
때문에 플라빅스 같은 신약의 특허문제는 제약회사들에는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분쟁은 과학적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분쟁의 발단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노피아벤티스는 1983년 국내 특허를 받은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랠'과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만 다른 '클로피도그랠 우선성 이성체'라는 물질로 다시 특허를 획득했다.
이로 인해 당초 2003년 만료 예정이던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는 2011년으로 연장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7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이에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988년 특허는 1983년 특허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소금이란 물질을 발견해 특허를 낸 사람이 이전에는 8각형 소금이었지만 이번에는 6각형 소금이라며 또다시 특허를 신청하려는 격"이라는 게 국내 제약회사들의 논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국내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승리를 예상하고 플라빅스에 대한 '대항마(제네릭약품)'를 준비 중이던 국내 제약회사들은 환호했다.
특히 동아제약(제품명 플라옥스) 동화약품(클로피) 참제약(세레나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
사노피아벤티스는 즉각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약품 출시로 인한 매출 타격을 막기 위해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허연장 꼼수'vs '특허권 여전히 유효'
사노피아벤티스측은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여타 제약사들이 플라빅스를 모방한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급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2011년까지 보장된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사노피아벤티스가 플라빅스 특허와 관련해 보여준 행동들은 특허를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등 일부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미 플라빅스에 대항할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 허가를 획득해 놓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를 섣불리 시장에 출시했다가 특허 관련 소송에서 지게 되면 특허 침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시점을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특허 관련 분쟁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특허분쟁을 대리하는 한 변리사는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특허기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으며,이는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노피아벤티스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플라빅스의 특허권 연장 문제를 놓고 현지 제네릭약품 제조사와 유사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얼굴의 특허
이번 사건은 얼핏 보면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특허제도'가 '과학적 발명'과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맺는 함수관계를 알 수 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기술 발전은 물론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사노피아벤티스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어떤 회사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설파했던 경제학의 선구자 아담 스미스의 지적을 이 문제에 대입해 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진리추구에 대한 과학자의 열정이 아니라 특허제도"라는 주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플라빅스 분쟁은 특허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플라빅스의 특허권이 보장되는 기간에는 독점적 이윤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플라빅스의 특허권이 연장될수록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들은 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특허권이 인정되는 한 '오리지널 신약 특허 만료→제네릭 의약품 다수 출시→공급자 경쟁에 의한 제품 가격 인하'라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과학적 발명을 북돋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반대급부로 다수 소비자들의 편익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적 발명 장려'와 '사회전체의 복지 향상'을 고르게 도모할 수 있는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고민해보자.
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oasis93@hankyung.com
심근경색 뇌졸중 치료제인 '플라빅스'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와 이 회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가 그 주인공.분쟁의 핵심은 사노피아벤티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가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 여부다.
보통 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그 제품을 모방한 제네릭 약품을 만들수 있다.
때문에 플라빅스 같은 신약의 특허문제는 제약회사들에는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분쟁은 과학적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분쟁의 발단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노피아벤티스는 1983년 국내 특허를 받은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랠'과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만 다른 '클로피도그랠 우선성 이성체'라는 물질로 다시 특허를 획득했다.
이로 인해 당초 2003년 만료 예정이던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는 2011년으로 연장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7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이에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988년 특허는 1983년 특허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소금이란 물질을 발견해 특허를 낸 사람이 이전에는 8각형 소금이었지만 이번에는 6각형 소금이라며 또다시 특허를 신청하려는 격"이라는 게 국내 제약회사들의 논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국내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승리를 예상하고 플라빅스에 대한 '대항마(제네릭약품)'를 준비 중이던 국내 제약회사들은 환호했다.
특히 동아제약(제품명 플라옥스) 동화약품(클로피) 참제약(세레나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
사노피아벤티스는 즉각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약품 출시로 인한 매출 타격을 막기 위해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허연장 꼼수'vs '특허권 여전히 유효'
사노피아벤티스측은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여타 제약사들이 플라빅스를 모방한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급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2011년까지 보장된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사노피아벤티스가 플라빅스 특허와 관련해 보여준 행동들은 특허를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등 일부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미 플라빅스에 대항할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 허가를 획득해 놓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를 섣불리 시장에 출시했다가 특허 관련 소송에서 지게 되면 특허 침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시점을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특허 관련 분쟁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특허분쟁을 대리하는 한 변리사는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특허기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으며,이는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노피아벤티스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플라빅스의 특허권 연장 문제를 놓고 현지 제네릭약품 제조사와 유사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얼굴의 특허
이번 사건은 얼핏 보면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특허제도'가 '과학적 발명'과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맺는 함수관계를 알 수 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기술 발전은 물론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사노피아벤티스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어떤 회사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설파했던 경제학의 선구자 아담 스미스의 지적을 이 문제에 대입해 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진리추구에 대한 과학자의 열정이 아니라 특허제도"라는 주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플라빅스 분쟁은 특허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플라빅스의 특허권이 보장되는 기간에는 독점적 이윤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플라빅스의 특허권이 연장될수록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들은 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특허권이 인정되는 한 '오리지널 신약 특허 만료→제네릭 의약품 다수 출시→공급자 경쟁에 의한 제품 가격 인하'라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과학적 발명을 북돋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반대급부로 다수 소비자들의 편익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적 발명 장려'와 '사회전체의 복지 향상'을 고르게 도모할 수 있는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고민해보자.
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