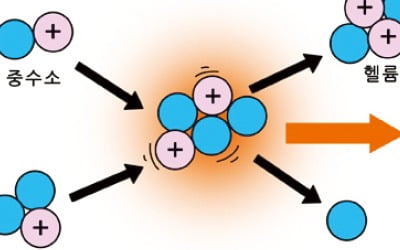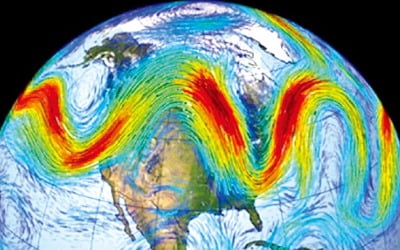국내 학계가 잇따른 논문 표절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지난달 사임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가 국제 학술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논문 표절을 부인하거나 고의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의혹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국내 학계가 또 한번 신뢰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들이 국내 학계에 만연한 논문 표절 관행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논문표절을 처벌하는 연구윤리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다른 학술지 논문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면 표절"
서울대 의대 서모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의·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콜로지컬 리뷰(Pharmacological Review)로부터 논문 표절 판정을 받았다.
서 교수는 2002년 이 학술지 9월호에 알츠하이머병(치매)에 영향을 주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란 단백질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파마콜로지컬 리뷰는 그러나 지난 6월호에서 "서 교수가 논문의 3개 문단에서 다른 학술지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해 과학 출판물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논문에 대해 정정 조치를 내렸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논문을 쓰면서 600편의 외국 학술지를 인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술지측은 표절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교수 시절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부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부총리의 논문과 신씨의 논문은 제목부터 비슷하며 거의 똑같은 표 5개가 함께 실려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된 것.
김 전 부총리는 "신씨에게서 사전에 논문 데이터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신씨의 데이터,문구,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해 표절 판정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국내 대학들 자정 움직임 일어
국내 학계에서는 표절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문 표절을 죄라기 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치부해 온 학계 풍토가 논문 표절 스캔들을 불러온 주범이라는 자체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논문표절을 막기 위한 자정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등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미 설치돼 있는 교원윤리위원회 기능을 높여 학문 윤리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논문 표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문정책과 학문윤리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논문 심사자의 실명을 공개해 인정에 끌려 심사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심사자 실명제'와 표절 연구자에 대해 교수 임용이나 승진을 취소시키는 징계절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논문 표절 처벌을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 나서
정부도 학문 윤리 정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사건을 계기로 표절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법을 도입키로 하면서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징계절차 명문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미국도 법률에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부가 표절을 없애기 위해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표절 문제가 학계의 병폐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로써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법치"라면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며 학문윤리는 학계 자율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
"이름 끼워넣기...대필...자기 표절..."
◆ 부끄러운 부정 논문들
국내 학계는 논문 표절 외에 다양한 연구 부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연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서도 논문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름 끼워넣기'를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제자의 논문에 지도교수가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도교수 친구의 이름까지 함께 올라가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다른 사람에게 논문작성을 맡기는 '대필 논문'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자도 아닌 명문대 학부생이 대신 써준 박사과정 논문이 다른 대학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2003년 4월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석·박사과정 501명과 학사과정 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3.7%가 타인의 논문을 대필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표한 논문 제목을 약간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다른 학술지에 싣는 '중복 게재'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전작 논문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자기 표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홍종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은 "연구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연구성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심사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지난달 사임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가 국제 학술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논문 표절을 부인하거나 고의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의혹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국내 학계가 또 한번 신뢰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들이 국내 학계에 만연한 논문 표절 관행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논문표절을 처벌하는 연구윤리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다른 학술지 논문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면 표절"
서울대 의대 서모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의·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콜로지컬 리뷰(Pharmacological Review)로부터 논문 표절 판정을 받았다.
서 교수는 2002년 이 학술지 9월호에 알츠하이머병(치매)에 영향을 주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란 단백질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파마콜로지컬 리뷰는 그러나 지난 6월호에서 "서 교수가 논문의 3개 문단에서 다른 학술지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해 과학 출판물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논문에 대해 정정 조치를 내렸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논문을 쓰면서 600편의 외국 학술지를 인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술지측은 표절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교수 시절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부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부총리의 논문과 신씨의 논문은 제목부터 비슷하며 거의 똑같은 표 5개가 함께 실려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된 것.
김 전 부총리는 "신씨에게서 사전에 논문 데이터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신씨의 데이터,문구,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해 표절 판정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국내 대학들 자정 움직임 일어
국내 학계에서는 표절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문 표절을 죄라기 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치부해 온 학계 풍토가 논문 표절 스캔들을 불러온 주범이라는 자체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논문표절을 막기 위한 자정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등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미 설치돼 있는 교원윤리위원회 기능을 높여 학문 윤리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논문 표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문정책과 학문윤리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논문 심사자의 실명을 공개해 인정에 끌려 심사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심사자 실명제'와 표절 연구자에 대해 교수 임용이나 승진을 취소시키는 징계절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논문 표절 처벌을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 나서
정부도 학문 윤리 정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사건을 계기로 표절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법을 도입키로 하면서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징계절차 명문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미국도 법률에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부가 표절을 없애기 위해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표절 문제가 학계의 병폐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로써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법치"라면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며 학문윤리는 학계 자율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
"이름 끼워넣기...대필...자기 표절..."
◆ 부끄러운 부정 논문들
국내 학계는 논문 표절 외에 다양한 연구 부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연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서도 논문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름 끼워넣기'를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제자의 논문에 지도교수가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도교수 친구의 이름까지 함께 올라가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다른 사람에게 논문작성을 맡기는 '대필 논문'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자도 아닌 명문대 학부생이 대신 써준 박사과정 논문이 다른 대학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2003년 4월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석·박사과정 501명과 학사과정 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3.7%가 타인의 논문을 대필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표한 논문 제목을 약간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다른 학술지에 싣는 '중복 게재'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전작 논문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자기 표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홍종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은 "연구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연구성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심사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