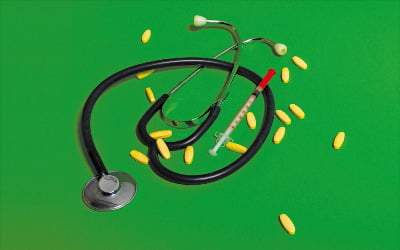#언어 변화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밥 한번 먹자" 남발해선 안되는 까닭
우리말에서 대표적 ‘친교어’ 중 하나로 꼽히는 “밥 한번 먹자”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있었던 한 국회의원의 자녀 결혼식 논란으로 인해서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의 해명 가운데 한 대목이다. 그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행정실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데 대해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으러 오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가 이 말을 가볍게 예의상 한 것으로 여겼는지 몰라도, 듣는 이에겐 많은 생각거리를 던질 만했다. 상황 따라 친목어가 수행어로 바뀌어우선,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읽히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은 특수한 위치에 있다. 대개는 실제로 밥을 같이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투적으로 하는 ‘친교어’로 쓰인다. 누군가에게 “담에 밥 먹자” “담에 연락할게”라고 할 때, 이는 굳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가면서 자주 못 보던 이에게 예의상 하는 말이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이 어디 가는지 사생활을 캐묻는 말이 아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잘 알기에 그냥 지나치고 만다.하지만 “밥 한번 먹자”가 직장같이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단순한 친교문도 수행문으로 바뀔 수 있다. ‘수행문(수행어)’이란 어떤 평가나 판단, 규정을 행하는 문장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이걸 리포터가 말했다면 그것은 진술문이다. 그는 발화를 통해 단순히 정보를 전달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우리말 조어법② '장티푸스-장질부사-염병'
100여 년 전 이 땅을 해마다 공포에 떨게 한 전염병은 ‘장질부사’와 ‘두창’ 같은 질병이었다. 의료시설은 낙후돼 있고, 위생도 열악하던 시절이었다. “장질부사 발생이 165인 내에 사망한 자 25인이요, … 두창 발생이 2047인 내에 사망한 자 539명이요, 천연두 환자 제일 다수하다더라.” 1920년 조선일보는 7월 14일 자에서 6월 한 달간 경기도의 전염병 발생 현황을 자세히 전했다. ‘장질부사’는 음역어, ‘염병’은 환칭‘장질부사(腸窒扶斯)’는 ‘장티푸스(腸typhus)’를 가리키던 말이다. 지금은 외래어를 현지 발음에 맞춰 한글로 적으면 되지만, 당시만 해도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없었다.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는 주로 한자음을 빌려 썼다. 이른바 ‘음역어’인데,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름 붙인 것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었다.‘장티푸스’는 티푸스(typhus)균이 장(腸)에 들어가 일으키는 병이란 뜻으로, ‘장’과 ‘티푸스’를 합성한 말이다. 이를 중국에서 ‘腸窒扶斯’로 적고 [창즈푸쓰] 정도로 읽던 것을 우리 한자음, 즉 음역어로 읽은 것이 ‘장질부사’다.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이라 하고, 프랑스를 ‘불란서’라 말하는 게 음역어 방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익히고 말하는 ‘미국, 영국, 독일, 태국’ 같은 게 다 그렇게 우리말 체계에 들어왔다.당시 ‘장질부사’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나중에 ‘염병’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다. ‘염병(染病)’은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전염병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장티푸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