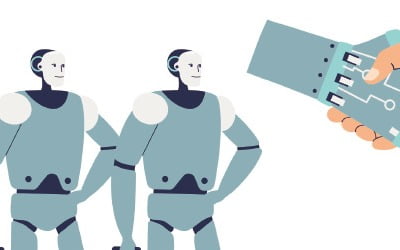#디지털 경제와 한계생산성
-
디지털 이코노미
"첨단기술도 인간과 협업해야 생산성 극대화"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스’에 짧은 글을 남겼다. 제목은 매우 대담했다. ‘프리드먼 독트린’. 프리드먼은 기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높여 주주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올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1980년대는 경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시기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기업의 수익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됐다. 당시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자동화와 노동 대체가 존재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조업 소득 가운데 노동에 돌아가는 몫 역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70% 수준으로 일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기업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했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경쟁이었다.특히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 미국 경영자들은 노동을 더 이상 자원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여겼다. 자연스럽게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은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자동화로 근로자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은 1980년대까지 제조 현장에서 로봇 도입에 뒤처진 국가였다. 인구가 풍부한 덕에 로봇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미국 제조업에서도 로봇이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다.독일에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을 가지고도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