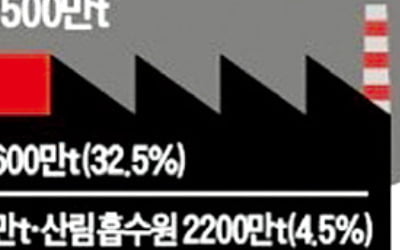#온실가스 감축
-
경제 기타
미국 탈퇴·후발 개도국들은 기준완화 요구… 진통 여전
정부가 지난달 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맞추려던 감축 목표를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기로 한 게 골자다. 국내 기업이 떠안아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이 종전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정부가 이 같은 감축 로드맵을 정한 것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해서다. 이를 계기로 파리협정에 대한 관심도 환기되고 있다.미국 탈퇴로 고비 맞은 파리협정파리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국제 환경협정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됐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의미에선 교토의정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 서명국이 19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37개국에 불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2030년까지 서명국들이 감축할 ‘온실가스 목표량’과 ‘이행 강제성’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파리협정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지난해 6월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주도로 협정을 마련했지만 자국 경제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당시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4년까지 26~28% 감축)를 미국이 지키려면 3조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이 줄고,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빠지자 파리협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탈퇴 지지 측은 “비과학적이고 미국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지구 환경 보호에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유럽 주